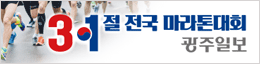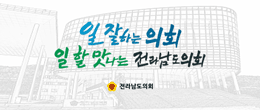내 마음속 정류장 - 고성혁 시인
 |
해거름 억새가 흔들린다. 낙엽 끝에 달린 붉은 감 몇 알이 산 그리메를 적시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먼 들판의 트랙터 소리 적막을 깨운다. 발자국 소리에 놀라 푸드덕 가을 물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새들. 서편 하늘이 붉디 붉다. 문득 마음 한 켠에 반짝 켜지는 등불 하나. 아, 가을이다. 가을이 왔다.
숱한 사연과 곡절 속에서도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고 가신 어머니와, 먹을거리를 위해 남의집살이를 떠났던 누님의 뒷모습. 바닷물에 빠져 창졸간에 목숨이 다한 내 머리칼을 잡아끌어 올렸던 형님과 납부금을 대납해주셨던 중2 담임 선생님. 키가 훌쩍 컸던 그분은 자주 앞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셨다. 또 있다. 광화문 감리교빌딩 세차장 시절 긴 낭하 끝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던 내게 뜨거운 라면냄비를 건네던 이름마저 잊은 경상도 아가씨. 그녀의 모습이 까무룩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 문드러진 내 동심을 소생시켜 선의 본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정채봉 선생님과 평생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작은 마을 교회의 종지기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권정생 선생님.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태석 신부님. 책에서, TV에서 만난 어른들이다.
지난 여름 긴 장마 속에서 또 한 분의 어른을 만났다. 김장하 선생님.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뭉클해 한참이나 멍해 있었다. 경남 진주 등지에서 육십 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번 돈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해 국가에 헌납하신 분. 수많은 젊은이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지역신문과 문화예술단체, 환경운동연합과 가정법률상담소 등 진주의 시민단체를 꾸준히 보살폈던 어른. 하지만 도운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았으니 그가 한 일을 아무도 몰랐다. 인터뷰어를 응시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대꾸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자 감동이 몰아쳤다. 물신 속, 자기 자랑이 일상화된 오늘날 삶의 방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리라는 말. 그런 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건만 그걸 평생 실천한 분이라니. 진심을 다해 누굴 도운 적이 없었던 나를 떠올렸다. 아, 욕심을 따라 껄떡거리던 정신머리. 방정맞기만 했던 몸뚱이….
일찍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을 깨닫고 베풂의 기억마저 털어낸 어른 김장하. 그분의 삶을 오래 되작이다 우리 광주를 생각했다. 우리 곁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곪아 터진 지역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텐데. 문득 지난 8월 광주일보에 기고한 박석무 선생의 글 ‘재물을 보존하며 아름답게 사는 삶’을 회상했다. 선생께서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신 모양이었다. 다행히 우리 광주에도 모든 재산을 어렵고 가난한 이웃이나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베푼 어른이 계신다고 했다.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을 만난 느낌이 이럴까. 이 가을이 가기 전 진주MBC처럼 어느 언론이 나서 이분의 삶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몸피를 줄여야만 겨울을 나는 낙엽의 신비. 김장하 어른은, 그런 분들은 무엇을 버리며 자기 삶을 간추렸을까.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어김없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이 가을.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음에 숲 그늘 곤줄박이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창밖 흐드러진 국화에게도 손을 흔든다. 작별이 서러워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청춘이 그리워 눈가를 훔친다. 모든 기쁨은 살아서의 일이고 모든 슬픔도 살아서의 일. 미욱한 이 가을의 경계를 지나면 혹여 온 생의 기억이 흰 눈으로 변해 내 지나온 세상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까. 가을이라며 먼저 가는 이여, 가는 길에 억새 흰 그림자 온 강에 흩뿌려 가을이 왜 가을인가를 가르쳐주시길. 가는 것이 아주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도 그저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리는 이 계절, 부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우정도 떠내려가는 물결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돌아보니 가을 버스가 산모롱이를 휘돌고 있다. 덩달아 내 마음속 정류장에서도 버스 하나 시동을 건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숲 그림자에 어른거린다. 나와 스친 사람, 인연 안의 모든 사람이 고맙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야 하는 가을, 삶의 처음과 끝을 생각하게 하는, 자신의 문은 닫고 타인을 향한 문을 열게 하는 가을이 왔다.
일찍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을 깨닫고 베풂의 기억마저 털어낸 어른 김장하. 그분의 삶을 오래 되작이다 우리 광주를 생각했다. 우리 곁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곪아 터진 지역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텐데. 문득 지난 8월 광주일보에 기고한 박석무 선생의 글 ‘재물을 보존하며 아름답게 사는 삶’을 회상했다. 선생께서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신 모양이었다. 다행히 우리 광주에도 모든 재산을 어렵고 가난한 이웃이나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베푼 어른이 계신다고 했다.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을 만난 느낌이 이럴까. 이 가을이 가기 전 진주MBC처럼 어느 언론이 나서 이분의 삶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몸피를 줄여야만 겨울을 나는 낙엽의 신비. 김장하 어른은, 그런 분들은 무엇을 버리며 자기 삶을 간추렸을까.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어김없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이 가을.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음에 숲 그늘 곤줄박이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창밖 흐드러진 국화에게도 손을 흔든다. 작별이 서러워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청춘이 그리워 눈가를 훔친다. 모든 기쁨은 살아서의 일이고 모든 슬픔도 살아서의 일. 미욱한 이 가을의 경계를 지나면 혹여 온 생의 기억이 흰 눈으로 변해 내 지나온 세상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까. 가을이라며 먼저 가는 이여, 가는 길에 억새 흰 그림자 온 강에 흩뿌려 가을이 왜 가을인가를 가르쳐주시길. 가는 것이 아주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도 그저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리는 이 계절, 부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우정도 떠내려가는 물결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돌아보니 가을 버스가 산모롱이를 휘돌고 있다. 덩달아 내 마음속 정류장에서도 버스 하나 시동을 건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숲 그림자에 어른거린다. 나와 스친 사람, 인연 안의 모든 사람이 고맙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야 하는 가을, 삶의 처음과 끝을 생각하게 하는, 자신의 문은 닫고 타인을 향한 문을 열게 하는 가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