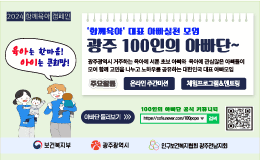자립 준비 청년들 실태 파악·지원책 서둘러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동들은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이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한다. 한데 전남 지역에서 아동 양육 시설을 떠난 이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 준비 청년 중 20%에 달하는 136명이 지원 기관과 연락이 끊겨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실태조사로 파악된 전남 지역 자립 준비 청년들은 모두 1128명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다. 이들 중 전남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관리 중인 인원이 688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문제는 688명 중 군 입대나 결혼·출산 등에 따라 본인 거부로 실태 파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락이 두절된 136명의 행방이다. 광주의 경우 자립 준비 청년 491명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전남의 미확인 청년 숫자가 너무 많아 지역 사회의 우려가 크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양육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 중이던 10대 ‘자립 준비 청년’ 두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져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공공 지원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립 정착금은 1인당 500만 원 안팎이고,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3년간 지원하는데 이는 월세 내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뒤 일상에서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주거·의료 등 각 분야에서 촘촘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진학·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속한 소재 파악을 통해 상담과 멘토링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뒤 일상에서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주거·의료 등 각 분야에서 촘촘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진학·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속한 소재 파악을 통해 상담과 멘토링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