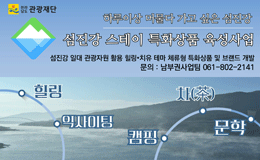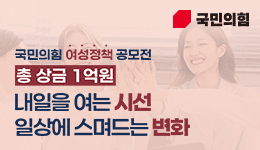‘학폭 미투’
“여자 선수들은 사흘만 풀어놓아도 엉덩이에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법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여자배구 팀에 금메달을 안긴 다이마쓰 히로부미 감독이 했던 망언이다. “죽을힘을 다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그는 선수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문제는 훈련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은 기본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코트에서 선수들을 두들겨 패다가 관중들에게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1978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배구협회는 이 일본 감독을 여자 대표 팀 고문으로 초빙해 선수들에게 특별훈련을 시킨 적이 있다. 하지만 혹독한 합숙 훈련에 반기를 든 선수가 팀을 이탈하고, 협회는 유망 선수를 제명하는 등 적지 않은 파동을 겪었다. 물론 구기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동) 획득이라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일본에서 도입된 합숙 훈련이 초중고 학교 운동부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군사정권 때인 1970년대 ‘대학 입학 특기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이후 ‘성적 지상주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른바 ‘군기’를 강요하는 요인이 됐고, 이로써 체육계는 지도자가 선수를 때리고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스카우트 시스템’도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다. 선수가 프로 팀에 스카우트되면 학교에 지원금이 들어가고 지도자는 이를 기반으로 팀을 운영한다. 이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의 성적을 좌우하는 팀의 에이스가 후배들을 폭행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자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폭로 사건이 일파만파 전체 스포츠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체육의 성적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합숙 훈련 관행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이제 체육 특기자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에서 ’클럽 체육‘으로 전환하는 등 체육계 전반에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계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학폭(학교폭력)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kwangju.co.kr
일본에서 도입된 합숙 훈련이 초중고 학교 운동부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군사정권 때인 1970년대 ‘대학 입학 특기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이후 ‘성적 지상주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른바 ‘군기’를 강요하는 요인이 됐고, 이로써 체육계는 지도자가 선수를 때리고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여자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폭로 사건이 일파만파 전체 스포츠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체육의 성적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합숙 훈련 관행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이제 체육 특기자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에서 ’클럽 체육‘으로 전환하는 등 체육계 전반에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계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학폭(학교폭력)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