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5천년 역사·문화를 차(茶)로 풀다
차의 시간을 걷다
김세리·조미라 지음
김세리·조미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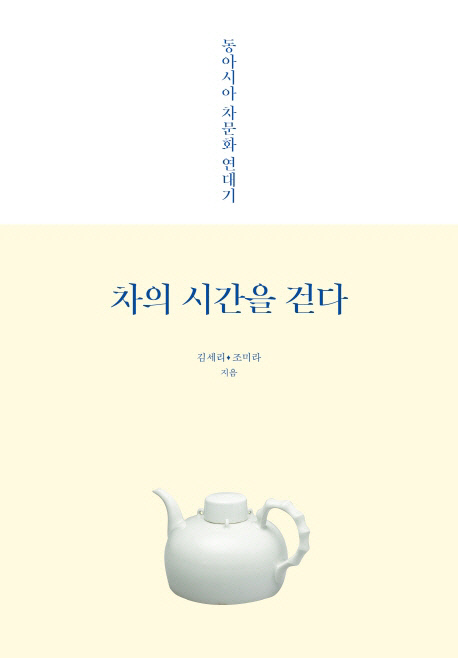 |
“오늘날 우리는 찻잎을 우려서 마시지만, 차를 달인다는 동사 역시 사용한다. 천 년도 더 넘은 오래전에는 차를 달여서, 그러니까 끓여서 마셨기 때문이다. 단차는 만들어진 과정만큼 그에 합당한 세심한 과정을 거쳐 끓여야 했다. 조각내거나 갈아서 적당한 크기로 가루 내고, 곱게 체 치고, 특별히 좋은 물을 구하거나 특별한 숯을 이용하여 열 조절을 할 뿐 아니라 체를 칠 때 사용하는 비단으로 만든 천조차도 어느 지방 것이 좋은지를 따졌다.”(본문 중에서)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냉면, 홍차 쿠키…. 차를 이용해 만든 먹거리가 적지 않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게 차와 관련한 메뉴다.
그렇다면 차는 언제부터 마셨을까. 대체로 고대 중국에서 시작해 주변국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본다. 문헌을 보면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고유한 차문화를 형성했다. 이러한 차문화는 차를 마시는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차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김세리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소장과 ‘홍차의 거의 모든 것’의 저자 조미라가 펴낸 ‘차의 시간을 걷다’가 그것. 저자들은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스며든 차의 시간을 걸으며 매혹적인 차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그렇다면 중국 서남쪽 사천 지방에서 시작된 차는 어떻게 중국 전역을 거쳐 동아시아로 퍼져 나갔을까. 저자들은 수·당나라가 건설한 운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운하가 없었다면 1200년을 이어온 스테디셀러 ‘다경’은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다.
‘차의 신’으로 일컫는 ‘다경’을 쓴 육우도 운하의 혜택을 누렸다. 고아였던 육우는 양자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차를 연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당대 안진경을 비롯한 최고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신, 다성 등 차와 연관된 신선은 무엇에서 연유할까. 저자들은 차가 약이면서 기호품인 것은 차를 마신 후 신체적, 육신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본다.
“문인들은 차를 마신 후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곤 했다. 뛰어난 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사랑받는 것은 9세기 최고의 문인 노동의 ‘칠완다가(七椀茶歌)’일 것이다. ‘다선(茶仙)’이라 불릴 정도로 차를 즐겨 마신 노동은 ‘칠완다가’에서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될 듯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고 읊었다.”
중국 차문화의 정점은 송나라였다. 황제를 위한 전용 다원이 있었으며, 용봉단차를 만들어 외교의 매개로 사용했다. 상류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차를 즐길 수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었는데,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있었던 ‘다관’의 면면은 오늘의 카페와 유사하다.
차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이야기도 있다. 당나라에 유학을 와 있었던 최치원은 신라로 떠나는 사신 편에 고향집으로 차를 보냈다. 다산의 제자들은 정약용이 해배돼 강진을 떠나자 계(契)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유했다. 이른바 다신계가 바로 그것으로 이들은 구체적인 규칙까지 만들었다.
이밖에 책에는 문헌과 시각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돼 있어 차문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다경’은 물론 ‘입당구법순례기’, ‘가정집’, ‘동국이상국집’, ‘동경몽화록’, ‘몽양록’ 등 문헌과 옛 시는 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열린세상·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렇다면 차는 언제부터 마셨을까. 대체로 고대 중국에서 시작해 주변국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본다. 문헌을 보면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고유한 차문화를 형성했다. 이러한 차문화는 차를 마시는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차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김세리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소장과 ‘홍차의 거의 모든 것’의 저자 조미라가 펴낸 ‘차의 시간을 걷다’가 그것. 저자들은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스며든 차의 시간을 걸으며 매혹적인 차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차의 신’으로 일컫는 ‘다경’을 쓴 육우도 운하의 혜택을 누렸다. 고아였던 육우는 양자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차를 연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당대 안진경을 비롯한 최고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신, 다성 등 차와 연관된 신선은 무엇에서 연유할까. 저자들은 차가 약이면서 기호품인 것은 차를 마신 후 신체적, 육신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본다.
“문인들은 차를 마신 후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곤 했다. 뛰어난 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사랑받는 것은 9세기 최고의 문인 노동의 ‘칠완다가(七椀茶歌)’일 것이다. ‘다선(茶仙)’이라 불릴 정도로 차를 즐겨 마신 노동은 ‘칠완다가’에서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될 듯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고 읊었다.”
중국 차문화의 정점은 송나라였다. 황제를 위한 전용 다원이 있었으며, 용봉단차를 만들어 외교의 매개로 사용했다. 상류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차를 즐길 수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었는데,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있었던 ‘다관’의 면면은 오늘의 카페와 유사하다.
차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이야기도 있다. 당나라에 유학을 와 있었던 최치원은 신라로 떠나는 사신 편에 고향집으로 차를 보냈다. 다산의 제자들은 정약용이 해배돼 강진을 떠나자 계(契)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유했다. 이른바 다신계가 바로 그것으로 이들은 구체적인 규칙까지 만들었다.
이밖에 책에는 문헌과 시각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돼 있어 차문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다경’은 물론 ‘입당구법순례기’, ‘가정집’, ‘동국이상국집’, ‘동경몽화록’, ‘몽양록’ 등 문헌과 옛 시는 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열린세상·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