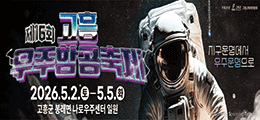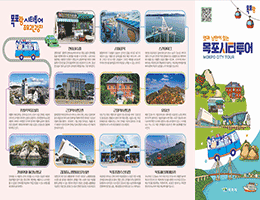<11> 마한의 복식
마한 초기부터 누에 길러 비단 만들고 옷에는 구슬 장식
금·은보다 구슬 귀중히 여겨 장신구로 활용
날상투·짚신 일반적…도포엔 말모양 허리띠
금·은보다 구슬 귀중히 여겨 장신구로 활용
날상투·짚신 일반적…도포엔 말모양 허리띠
 양직공도 백제사신 |
[고고학자 임영진 교수가 본 마한]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류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옷을 입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구석기시대에 주로 밤이나 새벽에 활동하는 맹수를 피하기 위해 낮에 사냥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장거리 사냥을 많이 하면서 체온 조절을 위해 털이 없어지자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지어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뼈바늘은 동물의 힘줄 같은 것을 이용하여 털가죽을 꿰매 입었음을 말해준다. 신석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동물의 털이나 식물성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들고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입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옷은 모두가 비슷하게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겠지만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신분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옷감이나 옷의 형태 뿐만 아니라 장신구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마한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구슬로 장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문헌기록 속의 마한 복식
‘후한서’ 동이열전을 보면,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 알며 길쌈하여 베를 짠다고 하였다. 또한 금·은 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슬을 귀중히 여겨 옷에 장식하며 목이나 귀에도 걸었다고 하였다. 상투를 드러내었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삼국지’에는 후한 명제가 여러 신지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하사하고 그 아래에는 읍장(邑長) 벼슬을 주었는데 그 풍속이 책을 쓰기를 좋아하여 한나라 군현에 갈 때는 인수를 차고 책을 쓴 사람이 천여명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길쌈은 언제부터 하였을까?
길쌈은 그 원리가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식물성 섬유의 종류나 섬세함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신석기시대 초부터 바구니를 사용하였던 증거가 있고, 삼실과 함께 뼈바늘이 출토되기도 하므로 삼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를 짜는 도구로는 간단한 구조의 요직기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벽화에서는 기능이 향상된 수직기가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때 여인들을 두 패로 나누어 길쌈 시합을 벌였다는 기사도 있다.
◇누에 길러 비단 만들어
비단은 마한 초기부터 짰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경의 비단과 함께 목제 바디가 출토된 것이다.
비단은 중국 신석기시대 앙샤오 문화부터 확인되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중국을 비단의 나라를 뜻하는 세리카(Serica)라 불렀고, 19세기 독일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은 중국과 로마 사이의 교역로를 실크로드라고 이름 지을 만큼 비단은 중국의 독보적 산물이었다.
당나라 문성공주가 토번 손챈캄포 왕에게 시집가면서 누에고치를 숨겨 갔다는 설화는 당시 비단 제조 기술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통제를 말해줄 것이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
실을 잣는 가락바퀴, 옷감을 짜는 바디, 옷을 짓는 뼈바늘과 삼실, 비단 조각 등은 발굴된 바 있지만 옷은 발굴된 바 없다. 옷은 단편적인 문헌기록과 그림을 통해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후한서’에는 베로 만든 도포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도포는 중국 ‘양직공도’ 백제사신 그림을 통해 확인된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남녀 모두 상의는 저고리를 입었지만 하의는 차이가 나서 남자는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다.
마한에서도 일반 남성들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여성들은 치마나 바지에 저고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포는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사람들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포에는 말모양 고리가 달린 허리띠를 두르고 신분을 상징하는 인수를 달았을 것이다.
◇모자나 신발은 어떠하였을까?
모자와 신발은 옷과 함께 용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후한서’에 상투를 드러냈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날상투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삼국지’는 인수와 책을 갖춘 사람이 천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므로 인수를 가진 관리들은 책을 써서 상투를 가렸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대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썼다고 하므로 책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양직공도’를 보면 백제 사신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턱끈으로 묶었음을 알 수 있는데 책은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나주 반남과 영암 시종에서는 5세기말경의 금동관이 출토되어 그 주인공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한다. 금동관은 독립된 세력의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나라별로 형태나 문양에서 차이가 난다. 나주와 영암의 금동관은 형태나 문양으로 보아 자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발은 짚신을 신는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신발꼴은 이미 가죽신을 만들고 있었음을 말해주며 ‘양직공도’ 백제 사신은 가죽신을 신고 있다.
◇옷에는 어떤 구슬을 장식하였을까?
마한 관련 기록에서 특별한 것은 금이나 은보다는 구슬 장식을 좋아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양한 구슬들이 발굴되고 있다. 재료만 하더라도 유리, 수정, 호박, 마노, 천하석 등 여러 가지이고, 형태도 곡옥, 원통옥, 환옥, 연주옥, 다면옥 등 다양하다.
마한 형성기에는 청동기시대의 천하석 옥 외에 중국 전국시대에 유행하였던 납-바리움 계통의 유리 관옥이 수입되어 사용되다가 기원전후경부터 유리구슬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3세기부터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금박유리구슬 등 특별히 수입된 구슬로 옷을 장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어디서 생산된 구슬을 어떻게 수입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트남 옥에오 구슬이 주목된다. 이 지역은 당시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 기항지였으며 마한·백제에서 흔히 출토되는 소다유리 생산지였기 때문이다.
중국 ‘양서’에 백제와 부남이 512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일본서기’에는 543년에 백제 성왕이 부남의 특산품을 보내주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부남은 메콩강 하류지역이고 옥에오는 여기에 있다.
마한 지역에서 출토된 1700여년 전의 소다유리 구슬들은 바다를 통한 동아시아의 교류 사실을 말해주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구체적인 교류 내용을 밝히는 일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류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옷을 입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구석기시대에 주로 밤이나 새벽에 활동하는 맹수를 피하기 위해 낮에 사냥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장거리 사냥을 많이 하면서 체온 조절을 위해 털이 없어지자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지어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리구슬 용범 (담양 태목리 유적 출토,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 |
옷은 모두가 비슷하게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겠지만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신분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옷감이나 옷의 형태 뿐만 아니라 장신구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마한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구슬로 장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트남 옥에오 구슬 (2019년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
 베트남 옥에오 구슬 (2019년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
◇문헌기록 속의 마한 복식
‘후한서’ 동이열전을 보면,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 알며 길쌈하여 베를 짠다고 하였다. 또한 금·은 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슬을 귀중히 여겨 옷에 장식하며 목이나 귀에도 걸었다고 하였다. 상투를 드러내었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삼국지’에는 후한 명제가 여러 신지들에게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하사하고 그 아래에는 읍장(邑長) 벼슬을 주었는데 그 풍속이 책을 쓰기를 좋아하여 한나라 군현에 갈 때는 인수를 차고 책을 쓴 사람이 천여명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길쌈은 언제부터 하였을까?
길쌈은 그 원리가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식물성 섬유의 종류나 섬세함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신석기시대 초부터 바구니를 사용하였던 증거가 있고, 삼실과 함께 뼈바늘이 출토되기도 하므로 삼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를 짜는 도구로는 간단한 구조의 요직기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벽화에서는 기능이 향상된 수직기가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때 여인들을 두 패로 나누어 길쌈 시합을 벌였다는 기사도 있다.
◇누에 길러 비단 만들어
비단은 마한 초기부터 짰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경의 비단과 함께 목제 바디가 출토된 것이다.
비단은 중국 신석기시대 앙샤오 문화부터 확인되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중국을 비단의 나라를 뜻하는 세리카(Serica)라 불렀고, 19세기 독일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은 중국과 로마 사이의 교역로를 실크로드라고 이름 지을 만큼 비단은 중국의 독보적 산물이었다.
당나라 문성공주가 토번 손챈캄포 왕에게 시집가면서 누에고치를 숨겨 갔다는 설화는 당시 비단 제조 기술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통제를 말해줄 것이다.
 말모양 허리띠고리 (국립부여박물관) |
◇어떤 옷을 입었을까?
실을 잣는 가락바퀴, 옷감을 짜는 바디, 옷을 짓는 뼈바늘과 삼실, 비단 조각 등은 발굴된 바 있지만 옷은 발굴된 바 없다. 옷은 단편적인 문헌기록과 그림을 통해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후한서’에는 베로 만든 도포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도포는 중국 ‘양직공도’ 백제사신 그림을 통해 확인된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남녀 모두 상의는 저고리를 입었지만 하의는 차이가 나서 남자는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다.
마한에서도 일반 남성들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여성들은 치마나 바지에 저고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포는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사람들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포에는 말모양 고리가 달린 허리띠를 두르고 신분을 상징하는 인수를 달았을 것이다.
◇모자나 신발은 어떠하였을까?
모자와 신발은 옷과 함께 용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후한서’에 상투를 드러냈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날상투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삼국지’는 인수와 책을 갖춘 사람이 천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므로 인수를 가진 관리들은 책을 써서 상투를 가렸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대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썼다고 하므로 책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양직공도’를 보면 백제 사신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턱끈으로 묶었음을 알 수 있는데 책은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나주 반남과 영암 시종에서는 5세기말경의 금동관이 출토되어 그 주인공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한다. 금동관은 독립된 세력의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나라별로 형태나 문양에서 차이가 난다. 나주와 영암의 금동관은 형태나 문양으로 보아 자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발은 짚신을 신는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신발꼴은 이미 가죽신을 만들고 있었음을 말해주며 ‘양직공도’ 백제 사신은 가죽신을 신고 있다.
 마한 구슬 (2005년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
마한 관련 기록에서 특별한 것은 금이나 은보다는 구슬 장식을 좋아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양한 구슬들이 발굴되고 있다. 재료만 하더라도 유리, 수정, 호박, 마노, 천하석 등 여러 가지이고, 형태도 곡옥, 원통옥, 환옥, 연주옥, 다면옥 등 다양하다.
마한 형성기에는 청동기시대의 천하석 옥 외에 중국 전국시대에 유행하였던 납-바리움 계통의 유리 관옥이 수입되어 사용되다가 기원전후경부터 유리구슬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3세기부터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금박유리구슬 등 특별히 수입된 구슬로 옷을 장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어디서 생산된 구슬을 어떻게 수입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트남 옥에오 구슬이 주목된다. 이 지역은 당시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 기항지였으며 마한·백제에서 흔히 출토되는 소다유리 생산지였기 때문이다.
중국 ‘양서’에 백제와 부남이 512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일본서기’에는 543년에 백제 성왕이 부남의 특산품을 보내주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부남은 메콩강 하류지역이고 옥에오는 여기에 있다.
마한 지역에서 출토된 1700여년 전의 소다유리 구슬들은 바다를 통한 동아시아의 교류 사실을 말해주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구체적인 교류 내용을 밝히는 일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