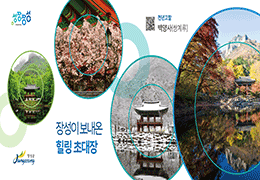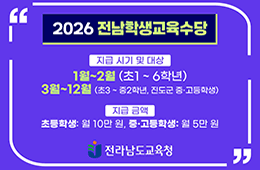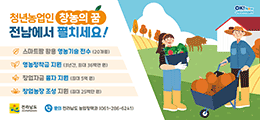[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우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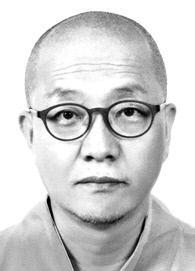 |
“우리 스님이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한쪽에 환한 한복을 차려 입은 보살님들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먼저 와서 연습을 마친 연합합창단인가 보다. 그 중 몇 분이 나를 보자 반갑게 외쳤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절에서 본 기억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보살님들과 반갑게 눈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앉으며 옆 자리의 스님에게 “제 법명이 우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절 밖에서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더했다. 그것도 광주 지역 여러 절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이는 행사장이다 보니 반가움은 더했다. 지난 성도재일 연합법회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살면서 의식하지도 못하게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가게’, ‘우리 절’…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들 마음 속에 그에 상응하는 방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은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이다. 마음 속에 가족이라는 방이 있으면, 가족이란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다. 바깥일에 피곤하고 지치면 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하나같이 “역시 집이 최고야!”라며 긴장을 풀고 편하게 늘어진다. 어디 ‘가족’뿐인가. ‘학교’, ‘회사’, ‘국가’ 등이 다 마찬가지다. 바로 공동체다. 그러나 공동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인간은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식구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뭐든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낀다. 달리 이유는 없다.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공동체를 위한 방이 존재하는 이유다.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고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1969년이니 겨우 50년 밖에 되지 않는 과거였다. 당시 40대였던 고 김대중 씨는 여의도에 운집한 백만 대중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유튜브로 들어간다. 카메라 앞에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편하게 이야기한다. 과거 광장으로 운집하던 백만 대중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 카페에서, 혼자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정치인을 접한다. 불과 반세기 만에 공동체가 사라져 버린 듯하다.
종교는 사정이 더하다. 나 홀로 신도는 물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래저래 사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다. 심지어 뭐든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급기야 신행 활동도 돈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행사장에서 나를 보며 “우리 스님이다”라고 외치던 보살님들의 반가운 표정에서, 그리고 법당으로 가는 가파른 돌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보살님의 구부정한 뒷모습에서, 분명하게 확인한다. 우리 속의 공동체는 여전히 건재하다. 무리 지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우리들을 흩어지게 할 뿐이다. 아니다. 세상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저 내 맘대로, 내 잘난 멋에 취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남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들 각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드라마를 보고, 혼자 술을 마실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숲 속에 함께 모여 수행하면서 수행 공동체인 승가(samgha)가 생겼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인도의 기후에서 우기 중에 탁발이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한 곳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안거 제도가 생겨났다. 당연히 최소한의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나서 오늘날의 절이 되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먼저 수행이 있고 가람이 만들어진 것이다. 절은 수행 공동체다. 절에 가는 이유는 함께 모여 수행하기 위함이다.
성도재일 행사의 마지막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발원문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발원문을 읽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 광주 지역의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불자’가 되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처럼 말끝마다 ‘우리’, ‘우리’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쓰고 보니 다 쓸데없는 잡설이다. 한마디면 된다. “안녕하세요! 우리 스님, 중현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한쪽에 환한 한복을 차려 입은 보살님들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먼저 와서 연습을 마친 연합합창단인가 보다. 그 중 몇 분이 나를 보자 반갑게 외쳤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절에서 본 기억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보살님들과 반갑게 눈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앉으며 옆 자리의 스님에게 “제 법명이 우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절 밖에서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더했다. 그것도 광주 지역 여러 절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이는 행사장이다 보니 반가움은 더했다. 지난 성도재일 연합법회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1969년이니 겨우 50년 밖에 되지 않는 과거였다. 당시 40대였던 고 김대중 씨는 여의도에 운집한 백만 대중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유튜브로 들어간다. 카메라 앞에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편하게 이야기한다. 과거 광장으로 운집하던 백만 대중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 카페에서, 혼자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정치인을 접한다. 불과 반세기 만에 공동체가 사라져 버린 듯하다.
종교는 사정이 더하다. 나 홀로 신도는 물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래저래 사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다. 심지어 뭐든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급기야 신행 활동도 돈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행사장에서 나를 보며 “우리 스님이다”라고 외치던 보살님들의 반가운 표정에서, 그리고 법당으로 가는 가파른 돌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보살님의 구부정한 뒷모습에서, 분명하게 확인한다. 우리 속의 공동체는 여전히 건재하다. 무리 지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우리들을 흩어지게 할 뿐이다. 아니다. 세상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저 내 맘대로, 내 잘난 멋에 취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남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들 각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드라마를 보고, 혼자 술을 마실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숲 속에 함께 모여 수행하면서 수행 공동체인 승가(samgha)가 생겼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인도의 기후에서 우기 중에 탁발이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한 곳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안거 제도가 생겨났다. 당연히 최소한의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나서 오늘날의 절이 되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먼저 수행이 있고 가람이 만들어진 것이다. 절은 수행 공동체다. 절에 가는 이유는 함께 모여 수행하기 위함이다.
성도재일 행사의 마지막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발원문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발원문을 읽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 광주 지역의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불자’가 되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처럼 말끝마다 ‘우리’, ‘우리’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쓰고 보니 다 쓸데없는 잡설이다. 한마디면 된다. “안녕하세요! 우리 스님, 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