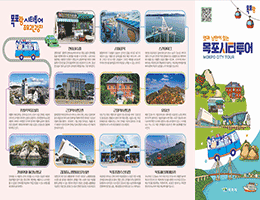[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
15세기 스페인제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으며 초강대국의 번영을 누린 나라다. 스페인 제국의 몰락은 무적함대의 패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압도적인 스페인 무적함대가 약한 영국 해군에게 패배한 이유는 오만함과 조급함 때문이었다. 영국 해군이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야금야금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펠리페 2세는 “이길 수 있다”라는 오만함으로 전쟁을 서둘렀다.
당시 신하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스페인 펠리페 2세는 당장 영국을 함락시키라고 지시한다. 미처 건조되지 않은 목재로 만든 물통을 싣고 말이다. 결국 얼마 못 가 물통이 썩기 시작했고 안에 든 물이 썩으면서 선원들은 병에 걸리고 만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국 해군에게 대패한다.
요즈음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대한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건군 90주년 기념식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선제타격론’이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하고 미국 자체 판단으로 핵위험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의 지형은 이미 중·러·북과 한·미·일로 양분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5년 12월 북한의 모란봉악단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다. 공연 중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면이 대형화면에 등장한 것을 보고 중국이 빼달라고 한 것을 북한이 거부해 발생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차였다. 중국과 북한과의 거리가 생긴 것은 우리에게는 천운이었으나 올 1월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 결별은 불가’라며 북한을 껴안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스페인 해군의 물통이 바로 ‘사드’였지 않을까. 왜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지금도 참으로 안타깝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북핵 미사일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북한도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 제자 중 율라투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강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수강료를 내라는 조건을 걸고 가르쳤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수강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말하길 “자네는 어쨌든 수강료를 내게 되어 있네. 소송에서 진다면 법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고, 이긴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하네”라고 하자 제자 율라투스는 “저는 어쨌든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 진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긴다면 법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맞선다.
이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역딜레마로써 극복한 사례다. 우리가 미국·일본과 함께 하면 중국·러시아와 적이 되고, 중국·러시아와 대화하면 미국·일본의 협력이 약화하는 상황이다.
칠레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의 원주민 언어인 야간(Yaghan)어에서 유래한 ‘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라는 단어가 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자신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자원하여 해주기를 바라며 보내는 눈빛이라는 의미다. 미국 트럼프도 중국의 시진핑도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또 다른 채널에서는 무언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은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접촉하여 실마리를 찾아 해결 당사자인 그들이 대화테이블에서 만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시국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역딜레마 해법으로 강(强)대 강(强)이 아닌 화(和)와 유(柔)로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요즈음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대한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건군 90주년 기념식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의 지형은 이미 중·러·북과 한·미·일로 양분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5년 12월 북한의 모란봉악단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다. 공연 중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면이 대형화면에 등장한 것을 보고 중국이 빼달라고 한 것을 북한이 거부해 발생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차였다. 중국과 북한과의 거리가 생긴 것은 우리에게는 천운이었으나 올 1월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 결별은 불가’라며 북한을 껴안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스페인 해군의 물통이 바로 ‘사드’였지 않을까. 왜 그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지금도 참으로 안타깝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북핵 미사일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북한도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 제자 중 율라투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강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면 수강료를 내라는 조건을 걸고 가르쳤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수강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말하길 “자네는 어쨌든 수강료를 내게 되어 있네. 소송에서 진다면 법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고, 이긴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하네”라고 하자 제자 율라투스는 “저는 어쨌든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 진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긴다면 법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맞선다.
이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역딜레마로써 극복한 사례다. 우리가 미국·일본과 함께 하면 중국·러시아와 적이 되고, 중국·러시아와 대화하면 미국·일본의 협력이 약화하는 상황이다.
칠레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의 원주민 언어인 야간(Yaghan)어에서 유래한 ‘마밀라피나타파이(Mamihlapinatapai)’라는 단어가 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자신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자원하여 해주기를 바라며 보내는 눈빛이라는 의미다. 미국 트럼프도 중국의 시진핑도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또 다른 채널에서는 무언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은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접촉하여 실마리를 찾아 해결 당사자인 그들이 대화테이블에서 만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시국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역딜레마 해법으로 강(强)대 강(强)이 아닌 화(和)와 유(柔)로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