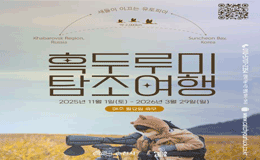명창 임방울과 아시아문화전당
송 성 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예전과 달리 요즘 서점가에서 1백만 권 이상을 판매한 도서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음반 시장도 마찬가지다. 불과 20년 전인 1995년 가수 김건모 씨가 세운 3집 앨범 280만 장 판매 기록은 앞으로도 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일제 강점기 광주가 낳은 최고의 명창 임방울 선생의 음반 ‘쑥대머리’가 1백만 장 넘게 팔렸다는 사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임방울 선생은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한을 노래한 음유시인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소리 인생’을 기리고 숨겨진 소리꾼을 발굴하기 위한 제23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광주 일원에서 열려 명창들의 열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 지하철 송정역 한쪽 대합실에는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임방울 선생은 서편제 소리의 ‘최후의 보루’로도 불린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편제는 남도 판소리를 대표한다. 서편제는 슬픈 계면조 가락에 박자와 장단이 멋스럽고 기교가 세련된 것으로 유명하다.
빛고을 광주는 임방울 선생과 같은 전통 예술인은 물론이고 예로부터 학덕 높은 선비와 시인·묵객을 많이 배출해 예향(藝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학과 노래·그림 등 다방면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의 면모를 꾸준히 유지해 온 광주에는 ‘문화예술’의 DNA가 도시 곳곳에 새겨져 있다.
‘광주 비엔날레’는 그 DNA가 현대적으로 발현되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미술 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에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문화 수준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문화 수도’로서 광주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 줄 경사가 또 하나 생겼다. 지난 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연 것이다. 2005년 국책사업으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13만 5000㎡(약 4만 781평)의 부지에 연면적 16만 1237㎡(약 4만 8774평)의 규모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연면적 13만 7255㎡)과 예술의전당(12만 8000㎡)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빛의 숲’을 콘셉트로 해서 건물 천장 곳곳에 채광정을 설치해 늘 빛이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도 볼거리다.
아직 부분 개관이건만, 문을 열자마자 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문화마켓의 중심이자 문화 생산기지가 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건만, 아직 그 안에 채워질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매머드급 규모의 전당에서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채워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적의 지점에서 공과 배트가 만날 때 홈런이 나온다. 콘텐츠의 성공 법칙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스토리가 잘 표현되어 사람들의 호감과 공감이 만났을 때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빅 킬러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이제 막 문을 연 아시아문화전당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아시아문화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흥행의 성공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콘텐츠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확신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해외 소비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한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광주에서도 보게 될지 모른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글로벌 문화 메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 지하철 송정역 한쪽 대합실에는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임방울 선생은 서편제 소리의 ‘최후의 보루’로도 불린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편제는 남도 판소리를 대표한다. 서편제는 슬픈 계면조 가락에 박자와 장단이 멋스럽고 기교가 세련된 것으로 유명하다.
‘광주 비엔날레’는 그 DNA가 현대적으로 발현되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미술 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에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문화 수준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문화 수도’로서 광주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 줄 경사가 또 하나 생겼다. 지난 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연 것이다. 2005년 국책사업으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13만 5000㎡(약 4만 781평)의 부지에 연면적 16만 1237㎡(약 4만 8774평)의 규모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연면적 13만 7255㎡)과 예술의전당(12만 8000㎡)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빛의 숲’을 콘셉트로 해서 건물 천장 곳곳에 채광정을 설치해 늘 빛이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도 볼거리다.
아직 부분 개관이건만, 문을 열자마자 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문화마켓의 중심이자 문화 생산기지가 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건만, 아직 그 안에 채워질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매머드급 규모의 전당에서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채워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적의 지점에서 공과 배트가 만날 때 홈런이 나온다. 콘텐츠의 성공 법칙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스토리가 잘 표현되어 사람들의 호감과 공감이 만났을 때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빅 킬러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이제 막 문을 연 아시아문화전당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아시아문화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흥행의 성공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콘텐츠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확신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해외 소비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한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광주에서도 보게 될지 모른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글로벌 문화 메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