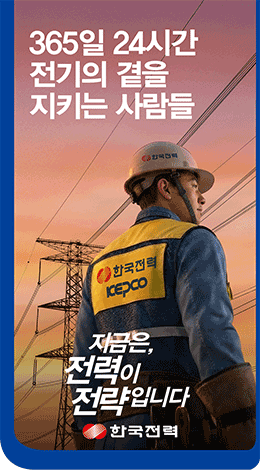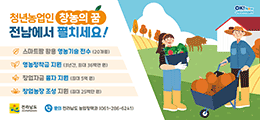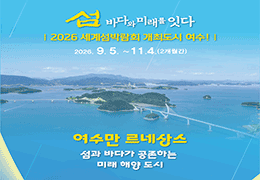토피도센터 VS 팔각정 스튜디오
지난 9일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다섯 명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알렉산드리아시(市)에서 활동하는 ‘토피도 팩토리 아트센터(Torpedo Factory Art Center·이하 토피도센터)’ 소속 공예가들이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헤이리 마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A Community of Artists(예술가들의 공동체)’에 참가한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들의 든든한 ‘백’인 토피도센터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도 그럴 것이 토피도센터는 ‘튀는’ 이름 만큼이나 독특한 배경으로 유명하다. ‘어뢰’라는 뜻을 지닌 토피도센터는 지난 1918∼1945년까지 군수품인 어뢰를 제작하는 공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가들의 꿈을 찍어내는 ‘드림팩토리’로 옷을 갈아입었다.
현재 이곳에는 회화, 공예, 뉴미디어 등 각 분야 165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작가들은 센터 1층에 마련된 6개의 갤러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한다.
뭐니뭐니해도 토피도센터의 강점은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어뢰를 제작하던 이곳이 종전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1969년 연방정부로부터 구입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이곳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역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로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1974년 토피도공장은 56년 간의 묵은 잔해를 털어내는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적 분위기의 ‘아트센터’로 탈바꿈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작가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작품 전시는 물론 판매 작품엔 면세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센터의 관리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맡겨 작가들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민들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들은 자주 이곳을 찾아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지켜본다.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해 작가들의 빈 지갑을 채워주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해 예술가들과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개관 30여년 만에 토피도센터는 매년 5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알렉산드리아에 토피토센터가 있다면 광주에는 ‘팔각정 스튜디오’(광주 중외공원 내)가 있다. 하지만 그 위상은 극과 극이다. 지난 1995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지원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들 작가의 작품활동을 돕는 전담 매니저는 고사하고 연간예산이 850만원에 불과해 공과금 내기에도 벅차다. 게다가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프로그램도 전무하다보니 찾는 사람이 없다. 오죽했으면 ‘스튜디오 입주=유배생활’이란 우스갯 소리가 나왔겠는가.
토피도센터를 문화사랑방으로 키운 건 8할이 시와 시민들의 관심이었다. 일개 스튜디오에서 간판급 랜드마크로 성장한 토피도센터의 성공스토리는 광주가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그도 그럴 것이 토피도센터는 ‘튀는’ 이름 만큼이나 독특한 배경으로 유명하다. ‘어뢰’라는 뜻을 지닌 토피도센터는 지난 1918∼1945년까지 군수품인 어뢰를 제작하는 공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가들의 꿈을 찍어내는 ‘드림팩토리’로 옷을 갈아입었다.
현재 이곳에는 회화, 공예, 뉴미디어 등 각 분야 165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작가들은 센터 1층에 마련된 6개의 갤러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한다.
뭐니뭐니해도 토피도센터의 강점은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어뢰를 제작하던 이곳이 종전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1969년 연방정부로부터 구입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이곳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역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로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1974년 토피도공장은 56년 간의 묵은 잔해를 털어내는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적 분위기의 ‘아트센터’로 탈바꿈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작가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작품 전시는 물론 판매 작품엔 면세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센터의 관리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맡겨 작가들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민들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들은 자주 이곳을 찾아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지켜본다.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해 작가들의 빈 지갑을 채워주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해 예술가들과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개관 30여년 만에 토피도센터는 매년 5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알렉산드리아에 토피토센터가 있다면 광주에는 ‘팔각정 스튜디오’(광주 중외공원 내)가 있다. 하지만 그 위상은 극과 극이다. 지난 1995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지원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들 작가의 작품활동을 돕는 전담 매니저는 고사하고 연간예산이 850만원에 불과해 공과금 내기에도 벅차다. 게다가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프로그램도 전무하다보니 찾는 사람이 없다. 오죽했으면 ‘스튜디오 입주=유배생활’이란 우스갯 소리가 나왔겠는가.
토피도센터를 문화사랑방으로 키운 건 8할이 시와 시민들의 관심이었다. 일개 스튜디오에서 간판급 랜드마크로 성장한 토피도센터의 성공스토리는 광주가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