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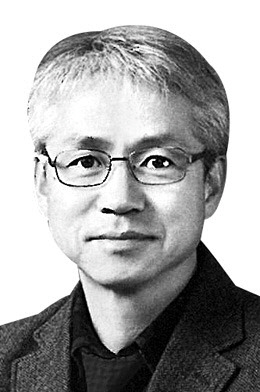 |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듯 다른 목적으로, 대조적 형태로 지어진 두 건축물이 있다.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다. 그러나 쓰임새와 시민들의 인식도는 여간 다르지 않다. 하나는 서울에서 누구나 꼭 가봐야 할 DDP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택시 기사분들도 어떤 건물인 잘 모르는 ACC가 되었다.
ACC는 2015년에 개관했다. 옛 전남도청을 포함한 주변 지역, 고려시대 광주읍성의 유허가 있던 부지에 완성되었다. 어려운 부지 조건과 기존 건물 유지, 도심 재생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난해한 숙제를 잘 해결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승 님이 잘 풀어 주었다. 옛 전남도청을 돋보이게 하고 모든 시설을 그라운드 제로 아래로 배치하며 옥상은 ‘빛의 숲’으로 꾸몄다. 넓은 도심 숲은 낮이고 밤이고 이용하기 좋다. 대신 큰 시설이지만 지면 아래로 내려간 건축물을 주변에서 잘 인식되지 않는다. 어떤 건물이 ACC인지 많은 사람이 모른다.
공간의 핵심 시설인 지하의 문화광장은 지상의 민주광장과 자연스레 연결되어야 하는데, 옛 전남도청 별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가로막혀 어정쩡하게 완공되었다. 개관 후엔 옛 전남도청 복원 이슈 속에 유일하게 지상에 있는 민주평화교류원과 방문자센터를 철거할 예정이다. ACC를 작동하는 5개 기관 중 오직 지상에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 그나마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월도 철거하기로 했다. 감동을 줄 요소들이 제거되고 있다. 택시 기사분들도 잘 모른다는 ACC의 운명인가 보다.
DDP는 2014년에 완공되었다. 옛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터이고 서울 성곽길이 놓였던 곳에 지어졌다.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것으로 우주선을 닮았느니, 신기한 형태라느니, 정체성이 없다느니 등등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다. 주변과 조화가 아닌 대비, 직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 자신을 낮추지 않고 들이대는 형태는 ACC와 다른 디자인 전략이다.
이런 디자인 전략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건축물, 방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건축물, 기이한 형상이 배경이 되어 다양한 미디어아트로 변신하는 건축물로 남아 있다. 일부 건축전문가들의 개관 초 혹평 속에서도 시민들의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ACC와 DDP는 아주 다른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다. 터의 성격과 역사성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조건과 고객의 요구가 다르고, 설계자와 운영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이 좋은 것인가? 잘 알려진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존재감은 없어도 튼튼하게 무난히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기쁨을 주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건축의 기본이라는 ‘튼튼함’ ‘편리함’ ‘기쁨’.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미 2천 년 전부터 이야기되었고, 지금도 유효하지만, 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건축은 튼튼해야 한다. 자연 영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며 기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인간이 발명한 최고 중 하나가 ‘도시’이고, ‘건축’이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을 통해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생존 능력을 높이고 문명을 만드는 일이 가능해졌다.
둘째, 건축은 편리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기능은 공간 형상에 맞추어 나름 재해석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엔 기능이 형태를 따르기도 하지만…. 편리함이란 절대적이지 않다. 상황에 맞춰 적응도 한다.
셋째, 건축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 튼튼함과 편리함만 있어도 건물 기능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건물은 좋은 건축이라고 하기 힘들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감탄과 감동이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에 추억을 품고, 기억하며 다시 가보고 싶은 건축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튼튼함, 편리함 그 이상의 단계다.
ACC와 DDP, 두 건물은 어떠한가. 기쁨은 건축물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건축과 사용자 사이의 교감에 의해 생긴다. 그 바탕은 안전하고,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건축에 관계된 사람들의 선택 결과로 만들어진다.
지역에 좋은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복이다. 그런 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갈망하고, 학습하고, 쟁취하여 만들어야 한다. 우리네 지역이 복이 많아야겠다.
DDP는 2014년에 완공되었다. 옛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터이고 서울 성곽길이 놓였던 곳에 지어졌다.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것으로 우주선을 닮았느니, 신기한 형태라느니, 정체성이 없다느니 등등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다. 주변과 조화가 아닌 대비, 직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 자신을 낮추지 않고 들이대는 형태는 ACC와 다른 디자인 전략이다.
이런 디자인 전략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건축물, 방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건축물, 기이한 형상이 배경이 되어 다양한 미디어아트로 변신하는 건축물로 남아 있다. 일부 건축전문가들의 개관 초 혹평 속에서도 시민들의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ACC와 DDP는 아주 다른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다. 터의 성격과 역사성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조건과 고객의 요구가 다르고, 설계자와 운영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이 좋은 것인가? 잘 알려진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존재감은 없어도 튼튼하게 무난히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 기쁨을 주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인가.
건축의 기본이라는 ‘튼튼함’ ‘편리함’ ‘기쁨’.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미 2천 년 전부터 이야기되었고, 지금도 유효하지만, 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건축은 튼튼해야 한다. 자연 영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며 기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인간이 발명한 최고 중 하나가 ‘도시’이고, ‘건축’이라고 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을 통해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생존 능력을 높이고 문명을 만드는 일이 가능해졌다.
둘째, 건축은 편리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기능은 공간 형상에 맞추어 나름 재해석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엔 기능이 형태를 따르기도 하지만…. 편리함이란 절대적이지 않다. 상황에 맞춰 적응도 한다.
셋째, 건축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 튼튼함과 편리함만 있어도 건물 기능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건물은 좋은 건축이라고 하기 힘들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감탄과 감동이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에 추억을 품고, 기억하며 다시 가보고 싶은 건축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튼튼함, 편리함 그 이상의 단계다.
ACC와 DDP, 두 건물은 어떠한가. 기쁨은 건축물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건축과 사용자 사이의 교감에 의해 생긴다. 그 바탕은 안전하고,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건축에 관계된 사람들의 선택 결과로 만들어진다.
지역에 좋은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복이다. 그런 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갈망하고, 학습하고, 쟁취하여 만들어야 한다. 우리네 지역이 복이 많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