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인의 소설처럼] 어느 소설가의 날카로운 예감 -링 마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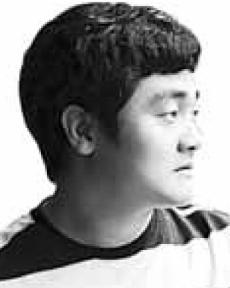 |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출간된 소설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그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단절되고, 단절 안에서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소설의 작가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졌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2018년에 장편소설 ‘단절’(Severance)을 발표한 중국계 미국 작가 링 마(Ling Ma)가 그렇다.
소설의 주인공 캔디스는 작가 링 마의 자전적 요소가 더러 있는 인물이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예술을 전공하고 출판 편집자로 일한 바 있는 작가로서 그려낸 캔디스라는 인물은 더없이 현실감 있다. 캔디스는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중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뉴욕의 출판 제작 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하나 스스로가 원하는 부서의 일은 아니다. 애인은 상의도 없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여유 없는 뉴욕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것만 같고, 그럴수록 캔디스는 일에 몰두한다. 주 업무는 중국 등지에 있는 하청업체에 인쇄와 제본을 맡겨 성경책을 생산하는 것이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들려온다. 그녀의 고향이자 아직도 친척 몇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그것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선 열병’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전파력이 빠르다. 증상은 현실의 바이러스와 판이한데, 신경 정신에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이 열병에 걸리면 평소 가장 자주하던 행동을 죽을 때까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무원은 키보드를 두드리길 반복한다. 택시 기사는 핸들을 잡고 도심을 배회한다. 마치 좀비처럼 정신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아, 어쩌면 그가 가장 지루해 했을 내재화된 루틴을 거듭한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을 때까지, 몸에 난 상처에 벌레가 꼬일 때까지, 이윽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은 삽시간에 세계를 삼킨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닿은 후, 뉴욕을 폐허로 만든다. 추운 지방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세계는 멈추었다. 뉴욕이 멈추었다는 말은 세계가 멈추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른다. 캔디스는 끝까지 뉴욕에 남는다. 위기의 상황에서 회사를 끝까지 지켜주면 거액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제안 때문이었지만, 멸망한 세계에서 화폐는 쓸모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모든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인류는 우왕좌왕한다. 아니 대다수 인류가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캔디스는 운이 좋게도 항체를 가진 듯하다. 전염병이 삼켜 버린 뉴욕의 기록을 담는다. 그러던 중,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염되지 않은 무리를 만나 합류한다.
소설은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의 삶을 은유하는 풍자소설처럼 읽히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 소설은 팬데믹 이전에 창작되었다. 소설가에게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것일까. 혹은 소설가의 삶과 소설가를 둘러싼 세계가 그의 통찰력을 논리적으로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로소 눈앞에 나타난 지구의 여러 문제가 그것이다. 구조화된 차별, 신자유주의의 폐해, 기후 위기와 가짜뉴스 등등.
캔디스가 비감염자 무리와 길을 떠나고, 쇼핑몰이었던 건물에 임시로 머물며 생기는 갈등과 상처는, 인간의 본질을 묻고 있다. 선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일들을 반복하며, 그들의 삶을 강제했던 문명의 명령을 정신이 없는 몸으로 충실히 따른다. 감염을 회피한 이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종교에 비합리적으로 빠져들고,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을 억압한다. 둘 다 어디선가 많이 본 풍경이다. 인류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가 날마다 형성하는 장면의 모음이라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시인>
병은 삽시간에 세계를 삼킨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닿은 후, 뉴욕을 폐허로 만든다. 추운 지방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세계는 멈추었다. 뉴욕이 멈추었다는 말은 세계가 멈추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른다. 캔디스는 끝까지 뉴욕에 남는다. 위기의 상황에서 회사를 끝까지 지켜주면 거액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제안 때문이었지만, 멸망한 세계에서 화폐는 쓸모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모든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인류는 우왕좌왕한다. 아니 대다수 인류가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캔디스는 운이 좋게도 항체를 가진 듯하다. 전염병이 삼켜 버린 뉴욕의 기록을 담는다. 그러던 중,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염되지 않은 무리를 만나 합류한다.
소설은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의 삶을 은유하는 풍자소설처럼 읽히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 소설은 팬데믹 이전에 창작되었다. 소설가에게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것일까. 혹은 소설가의 삶과 소설가를 둘러싼 세계가 그의 통찰력을 논리적으로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로소 눈앞에 나타난 지구의 여러 문제가 그것이다. 구조화된 차별, 신자유주의의 폐해, 기후 위기와 가짜뉴스 등등.
캔디스가 비감염자 무리와 길을 떠나고, 쇼핑몰이었던 건물에 임시로 머물며 생기는 갈등과 상처는, 인간의 본질을 묻고 있다. 선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일들을 반복하며, 그들의 삶을 강제했던 문명의 명령을 정신이 없는 몸으로 충실히 따른다. 감염을 회피한 이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종교에 비합리적으로 빠져들고,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을 억압한다. 둘 다 어디선가 많이 본 풍경이다. 인류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가 날마다 형성하는 장면의 모음이라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