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월… 항쟁의 진실을 문화로 되새기다
[공연·전시로 되살아난 5·18 40돌]
‘봄날’ ‘소년이 온다’ 등 소설화 현재진행형…민중미술도 오월 형상화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서 불려져…‘푸르른 날에’ 등 연극·뮤지컬 무대
‘봄날’ ‘소년이 온다’ 등 소설화 현재진행형…민중미술도 오월 형상화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서 불려져…‘푸르른 날에’ 등 연극·뮤지컬 무대
 2014년 6월 광주에서 공연된 연극 ‘푸르른 날에’ |
다시 오월이다. 올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했다. 문학을 비롯해 미술, 만화, 음악, 연극, 영화 등 각 분야에서 창작된 ‘5월 광주’ 문화 콘텐츠를 되짚어보고, 문화자산으로서 활용가능성을 모색해본다.
◇ 시, 5·18 영령들에게서 터져 나온 시어(詩語)=“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김준태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1980년 6월 2일, 신군부가 광주에서 자행한 살육의 피냄새와 비명이 채 가시지 않은 때에 한 시인은 펜을 들었다. 모두가 가슴속 터져 나오는 울분을 삭이면서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기였다. 항쟁을 줄곧 지켜봤던 시인은 분노와 슬픔, 희망, 사랑, 긍지를 한데 녹여 한편의 시를 써내려갔다. 골목길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M16 총상을 머리에 입고 숨을 거둔 24살 임산부의 넋이 빙의(憑依)된 듯 시어로 터져 나왔다.
“그 시는 광주 오월 영령들이 말해준 것을 단지 나는 받아서 썼을 뿐입니다. 시어(詩語)가 몸속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시적으로 말하면 무등산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106행에 달하던 시는 전남도청 2층에 있는 계엄사 검열관들에 의해 35행으로 3분의 2가 삭제됐으나 학살을 겪은 시민들은 삭제된 행간(行間)에서 광주의 ‘진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검열전 조판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진 시 전문은 서울로 전달돼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5·18 관련 시는 5월 영령들의 호곡성(號哭聲) 이었다. 시집 ‘매장시편’(임동확·1987년)과 장시집 ‘저 무덤위에 푸른잔디’(고정희·1989년)를 비롯해 옥중시 ‘학살2’(김남주)와 ‘부활의 노래’(문병란), ‘화엄광주’(황지우), ‘도둑없는 거리’(박몽구), ‘사월에서 오월로’(하종오), ‘나는 첫 아이였어요’(고규태) 등 많은 시들이 발표됐다.
◇소설, ‘봄날’에서 ‘소년이 온다’에 이르는 대장정=1980년 당시 전남대 영문과 4학년이었던 소설가 임철우는 4년 후 광주 항쟁을 처음으로 소설화한 ‘봄날’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7년부터 5권으로 된 같은 제목의 대하소설을 선보였다. 1995년에는 그동안 발표된 대표적인 5·18 소설을 묶은 작품집이 발간됐다. 작품집에는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최윤)를 비롯해 ‘십오방 이야기’(정도상), ‘얼굴’(이순원), ‘깃발’(홍희담) 등 소설 8편이 실렸다. 20주년을 맞았던 2000년에 소설가 송기숙의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와 문순태의 장편소설 ‘그들의 새벽’이 발표됐다. 특히 문학평론가들은 ‘창작과 비평’ 1988년 봄호에 발표된 홍희담 작가의 ‘깃발’에 대해 “광주민중항쟁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며 주목했다.
5월 광주의 소설화는 현재진행형이다. 2014년에 발표된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진압군에 맞서다 죽은 중학교 3학년 ‘동호’와 주변 인물들을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되살려냈다. 정찬주 작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항쟁에 참가한 이들을 실명(實名)으로 밝히는 다큐소설 ‘광주 아리랑’을 지난해 9월부터 광주일보에 매주 연재하고 있다. 작가는 “실명으로 다큐소설을 전개하는 까닭은 근로자와 빈민 또한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주 민중항쟁의 엄연한 실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술, 붓과 칼날에 민중미술 예술혼 불태워=강연균 화백은 1981년 11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미술관에서 열린 ‘구상화가 200호전’에 ‘하늘과 땅사이Ⅰ’을 출품한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광주학살에 대한 진실을 용기 있게 알리며 관람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1980년 5월을 거치면서 작가들은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판화와 걸개그림, 벽화 등 미술의 전 영역에 걸친 민중미술 운동을 펼쳤다. 5·18민주화운동 10주기였던 1990년 6월에 전남대 그림패 ‘마당’과 예술대 미술패 ‘신바람’,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중심으로 사범대 1호관 벽면에 그린 ‘광주 민중항쟁도’(가로 10m× 세로 16m) 또한 의미있는 작업이다.
1980년대 김경주·김진수·안한수·이상호·이준석·전정호·조진호·최상호·홍성담·한희원 등 광주 작가들은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칼끝에 응축시켜 판화로 강렬한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 일본 여성작가 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또한 외신보도를 통해 광주의 참상을 접하고 판화작업에 몰두했다. 쪽진 머리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광주의 피에타’(1980년)를 비롯해 ‘저항의 땅’(1980년), ‘광주의 레퀴엠’(1980년), ‘죽은 자들’(1981년)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이남, 하준수 등 미디어아트 작가들도 ‘빛’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캔버스 삼아 새로운 시도를 했다.
◇노래·음악,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5·18 민주화운동 대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원곡 악보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표기돼 있다)은 5·18 2주년을 맞아 1982년 4월께 공동 창작된 30분짜리 노래극 ‘넋풀이-광주에 살던 어느 두 젊은 넋의 죽음과 사랑에 관한 노래이야기’에 들어간 8곡 가운데 마지막 합창곡이다.
노래는 전국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애국가’처럼 불려졌다. 더욱이 홍콩과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지 인권·노동운동 현장에서도 애창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 중 ‘임’과 ‘새날’을 레드 콤플렉스 시각에서 편협하게 해석하며 정치적으로 매도했다. 정부 주관의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齊唱=동일한 가락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하는 것)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광주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결과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관현악곡과 피아노 협주곡, 환상곡이 탄생했다. 작곡가 김현옥(창작그룹 달빛오디세이 대표)은 마음속 부채의식을 레퀴엠의 장엄한 선율에 녹여낸 ‘칸타타 오월-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지난해 12월 초연했다.
◇연극, 그날의 진실 담아 신파극과 뮤지컬로 진화=1980~90년대에 ‘5월 광주’를 무대에 올리는 오월극(劇)은 ‘오월 광대’라 불렸던 연극인 박효선(1954~1998)이 주도했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이었던 그는 1983년에 극단 토박이를 창단했다. 항쟁후 도피생활을 한 자전적 이야기인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1985년)와 5월 27일 도청에서 희생된 전남대생 이정연의 삶을 여동생(금희)의 증언을 통해 그린 ‘금희의 오월’(1988년), 5·18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다룬 심리극 ‘모란꽃’(1993년),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김영철과 가족 이야기인 ‘청실홍실’(1997년) 등 5·18 진실을 알리는 연극운동에 열정을 바쳤다.
‘5월극’ 공연의 또 다른 축(軸)은 극단 신명과 극단 푸른연극마을이다. 1982년 창단된 마당극 전문 놀이패인 신명은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1988년), ‘언젠가 봄날에’(2010년)를 선보였고,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너에게로 간다’(원제 한남자·2018년)와 ‘그들의 새벽’(2018년), ‘고백’(2019년) 등 5·18 관련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렸다. 5·18 항쟁중 한쪽 눈을 실명한 이지현(5·18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씨는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애꾸눈 광대’를 2012년 처음 선보인 뒤 계속 작품내용을 다듬으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바깥에서도 5·18 연극이 제작됐다. 5월 광주에 ‘블랙 코미디’나 ‘명랑한 신파’ 등 통속극 색채를 입혀 연출한 연극 ‘짬뽕’(2004년)과 ‘푸르른 날에’(2011년)가 눈길을 끌었다. 황지우 시인이 쓴 희곡 ‘오월의 신부’(新婦)는 연극과 뮤지컬로 제작됐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시, 5·18 영령들에게서 터져 나온 시어(詩語)=“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김준태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106행에 달하던 시는 전남도청 2층에 있는 계엄사 검열관들에 의해 35행으로 3분의 2가 삭제됐으나 학살을 겪은 시민들은 삭제된 행간(行間)에서 광주의 ‘진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검열전 조판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진 시 전문은 서울로 전달돼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5·18 관련 시는 5월 영령들의 호곡성(號哭聲) 이었다. 시집 ‘매장시편’(임동확·1987년)과 장시집 ‘저 무덤위에 푸른잔디’(고정희·1989년)를 비롯해 옥중시 ‘학살2’(김남주)와 ‘부활의 노래’(문병란), ‘화엄광주’(황지우), ‘도둑없는 거리’(박몽구), ‘사월에서 오월로’(하종오), ‘나는 첫 아이였어요’(고규태) 등 많은 시들이 발표됐다.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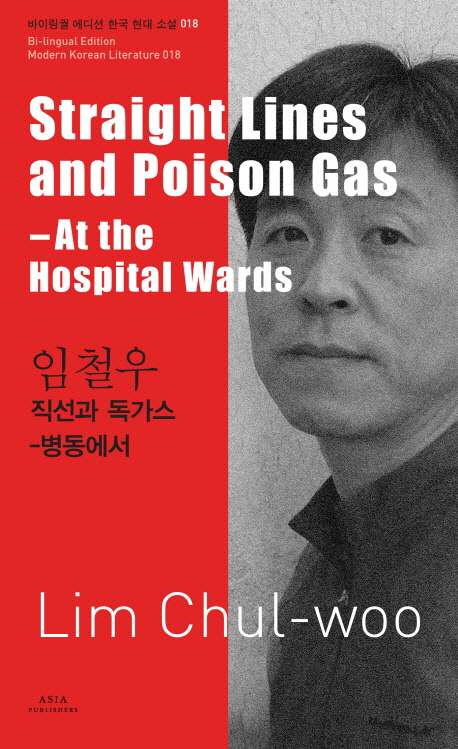 소설가 임철우의 ‘직선과 독가스’ |
5월 광주의 소설화는 현재진행형이다. 2014년에 발표된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진압군에 맞서다 죽은 중학교 3학년 ‘동호’와 주변 인물들을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되살려냈다. 정찬주 작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항쟁에 참가한 이들을 실명(實名)으로 밝히는 다큐소설 ‘광주 아리랑’을 지난해 9월부터 광주일보에 매주 연재하고 있다. 작가는 “실명으로 다큐소설을 전개하는 까닭은 근로자와 빈민 또한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주 민중항쟁의 엄연한 실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미야마 다에코 작 '광주의 피에타' |
1980년대 김경주·김진수·안한수·이상호·이준석·전정호·조진호·최상호·홍성담·한희원 등 광주 작가들은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칼끝에 응축시켜 판화로 강렬한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 일본 여성작가 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또한 외신보도를 통해 광주의 참상을 접하고 판화작업에 몰두했다. 쪽진 머리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광주의 피에타’(1980년)를 비롯해 ‘저항의 땅’(1980년), ‘광주의 레퀴엠’(1980년), ‘죽은 자들’(1981년)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이남, 하준수 등 미디어아트 작가들도 ‘빛’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캔버스 삼아 새로운 시도를 했다.
◇노래·음악,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5·18 민주화운동 대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원곡 악보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표기돼 있다)은 5·18 2주년을 맞아 1982년 4월께 공동 창작된 30분짜리 노래극 ‘넋풀이-광주에 살던 어느 두 젊은 넋의 죽음과 사랑에 관한 노래이야기’에 들어간 8곡 가운데 마지막 합창곡이다.
노래는 전국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애국가’처럼 불려졌다. 더욱이 홍콩과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지 인권·노동운동 현장에서도 애창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 중 ‘임’과 ‘새날’을 레드 콤플렉스 시각에서 편협하게 해석하며 정치적으로 매도했다. 정부 주관의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齊唱=동일한 가락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노래하는 것)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광주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결과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관현악곡과 피아노 협주곡, 환상곡이 탄생했다. 작곡가 김현옥(창작그룹 달빛오디세이 대표)은 마음속 부채의식을 레퀴엠의 장엄한 선율에 녹여낸 ‘칸타타 오월-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지난해 12월 초연했다.
◇연극, 그날의 진실 담아 신파극과 뮤지컬로 진화=1980~90년대에 ‘5월 광주’를 무대에 올리는 오월극(劇)은 ‘오월 광대’라 불렸던 연극인 박효선(1954~1998)이 주도했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이었던 그는 1983년에 극단 토박이를 창단했다. 항쟁후 도피생활을 한 자전적 이야기인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1985년)와 5월 27일 도청에서 희생된 전남대생 이정연의 삶을 여동생(금희)의 증언을 통해 그린 ‘금희의 오월’(1988년), 5·18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다룬 심리극 ‘모란꽃’(1993년),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김영철과 가족 이야기인 ‘청실홍실’(1997년) 등 5·18 진실을 알리는 연극운동에 열정을 바쳤다.
‘5월극’ 공연의 또 다른 축(軸)은 극단 신명과 극단 푸른연극마을이다. 1982년 창단된 마당극 전문 놀이패인 신명은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1988년), ‘언젠가 봄날에’(2010년)를 선보였고,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너에게로 간다’(원제 한남자·2018년)와 ‘그들의 새벽’(2018년), ‘고백’(2019년) 등 5·18 관련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렸다. 5·18 항쟁중 한쪽 눈을 실명한 이지현(5·18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씨는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애꾸눈 광대’를 2012년 처음 선보인 뒤 계속 작품내용을 다듬으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바깥에서도 5·18 연극이 제작됐다. 5월 광주에 ‘블랙 코미디’나 ‘명랑한 신파’ 등 통속극 색채를 입혀 연출한 연극 ‘짬뽕’(2004년)과 ‘푸르른 날에’(2011년)가 눈길을 끌었다. 황지우 시인이 쓴 희곡 ‘오월의 신부’(新婦)는 연극과 뮤지컬로 제작됐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