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스님] 그 안의 분노, 내 안의 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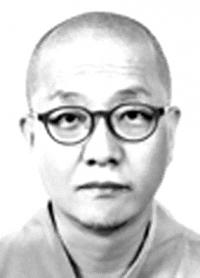 |
30대 중반 즈음의, 세련된 도시적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화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표정만으로는 마치 매사를 달관한 듯했다. 그러나 풀어내는 내용은 뜻대로 되질 않는 자신의 감정에 지쳐 버린 쪽에 더 가까워 보였다.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분노는 폭주하거나 아니면 체념으로 이어진다.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면 폭주보다는 체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체념 혹은 무력감은 일을 향한 의지와 열정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무력감이 빚어내는 매너리즘은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의 영혼까지 좀 먹지만, 그렇다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분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분노와 매너리즘이 동거하는 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아마도 그의 달관한 듯한 표정은 바닥난 멘탈을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술이었을 것이다.
그의 말을 들고 있자니, 나의 직장 생활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출가 전까지 화는 내 삶을 괴롭히는 큰 골치덩어리였다. 그러나 10년 이상 일을 떠나 살았더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만성적인 분노도 사라졌다. 비록 환경이 바뀐 탓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망각은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은 가벼운 짜증과 때로는 거친 분노를 내게 안겨 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일을 떠나 있던 나는 일이 선물하는 성취감은 기꺼이 만끽하되, 또 다른 선물인 스트레스는 애써 거절하고 싶었다. 어느샌가 나는 일이 많으면 많다고 짜증내고, 일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투덜대는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현대인에게 일은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이다.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일은 그 자체가 사회적이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내가 맡은 일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남의 일이라면 애당초 생기지도 않을 불안감이다. 내 맘대로 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일은 결코 한 사람만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설령 그 한 사람이 조직의 일인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일 속에서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 취급 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한다. 동시에 일을 통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요즘처럼 한없이 가벼운 시대적 트렌드를 따르자면 아무리 일이라도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아실현이든 재미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마디, ‘욕망’으로 귀결된다.
일은 개인적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일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도로 청소, 박스 포장, 홀 서빙 같은 일을 자아실현 혹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매순간 사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이 탈 없이 굴러간다. 일이 개인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가치관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에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은 욕망에 눈이 먼 어리석은 광대놀음이며, 일로 인한 분노와 매너리즘은 좌절된 욕망의 산물이다.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던 나는 왠지 그에게 속시원한 비책이라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말하려 하니 입안에서만 맴돌 뿐,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떠나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했다. 내 속을 아무리 속속들이 뒤져봐도 속시원한 비책 같은 것은 없었다.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서 괜히 뭔가 있는 것처럼 자신까지 속였던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아마도 길고도 긴 일의 공백이 만들어 낸 평화에 너무 오래 취해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 다시 하나 둘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를 생각해서라도 예전처럼 무책임한 짜증은 내지 말자고 혼자 다독이곤 한다. 그래야만 그에게 덜 미안할 것 같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화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표정만으로는 마치 매사를 달관한 듯했다. 그러나 풀어내는 내용은 뜻대로 되질 않는 자신의 감정에 지쳐 버린 쪽에 더 가까워 보였다.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분노는 폭주하거나 아니면 체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은 가벼운 짜증과 때로는 거친 분노를 내게 안겨 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일을 떠나 있던 나는 일이 선물하는 성취감은 기꺼이 만끽하되, 또 다른 선물인 스트레스는 애써 거절하고 싶었다. 어느샌가 나는 일이 많으면 많다고 짜증내고, 일이 없으면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투덜대는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현대인에게 일은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이다.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일은 그 자체가 사회적이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내가 맡은 일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남의 일이라면 애당초 생기지도 않을 불안감이다. 내 맘대로 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일은 결코 한 사람만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설령 그 한 사람이 조직의 일인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일 속에서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 취급 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한다. 동시에 일을 통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요즘처럼 한없이 가벼운 시대적 트렌드를 따르자면 아무리 일이라도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아실현이든 재미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마디, ‘욕망’으로 귀결된다.
일은 개인적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일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도로 청소, 박스 포장, 홀 서빙 같은 일을 자아실현 혹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매순간 사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이 탈 없이 굴러간다. 일이 개인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가치관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에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은 욕망에 눈이 먼 어리석은 광대놀음이며, 일로 인한 분노와 매너리즘은 좌절된 욕망의 산물이다.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던 나는 왠지 그에게 속시원한 비책이라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말하려 하니 입안에서만 맴돌 뿐,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떠나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했다. 내 속을 아무리 속속들이 뒤져봐도 속시원한 비책 같은 것은 없었다.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서 괜히 뭔가 있는 것처럼 자신까지 속였던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아마도 길고도 긴 일의 공백이 만들어 낸 평화에 너무 오래 취해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 다시 하나 둘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를 생각해서라도 예전처럼 무책임한 짜증은 내지 말자고 혼자 다독이곤 한다. 그래야만 그에게 덜 미안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