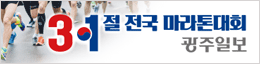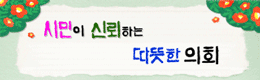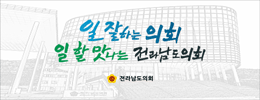[수필의 향기] 먼 손님처럼 오신 당신- 이 중 섭 소설가
 |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삼 년이 되었다. 고향 언덕배기의 추모관인 ‘세장당(世藏堂)’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좁은 공간에 안치한 유골함은 마음마저 갑갑하게 만든다. 자주 찾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대화의 단절이다. 시골에 어떤 일이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다. 막막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상속받은 밭에 대한 공공용지 보상도 마찬가지였다. 한 필지 소유자의 함자가 문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조그만 유자밭을 상속받았다. 가을 유자 축제로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주차할 장소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상속받은 유자밭이 공공용지에 포함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나야 물론 밭 관리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모든 것이 쉽게 처리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보니 밭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큰 필지 하나와 작은 필지가 셋이었다. 상속 이전처리를 할 때 두 필지는 제대로 했는데 밭 옆 도로에 속한 두 필지는 너무 작고 필요치 않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전이 안 된 두 필지 중 하나는 형제자매의 동의서류를 받으면 해결이 가능한 데 나머지 한 필지가 문제였다. 소유주가 ‘이○흥’으로 되어 있었다. 직계 조상이 아니었다. 집성촌이라 조상 중의 한 분이 분명한데 누구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나 어머니 생전이면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텐데 이미 돌아가셨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어른에게 물으려니 왠지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사 때 물어보자며 뒤로 밀어놓았다. 그런 상황에서 집성촌 세장당 제례 의식 날이 돌아왔다.
세장당에는 300구에 가까운 신위가 모셔져 있다. 당연히 참석하는 후손들도 많다. 하지만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 의례를 도와주는 제관들을 서로 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에는 축문을 읽는 축관이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급하게 내게 축문을 읽는 일이 맡겨졌다. 축관은 축문에 ‘현조고 학생 ○○ 부군 신위’라 쓰인 것을 300번 가까이 읽어야 한다. 축관이 혼자 읽을 때 나머지 후손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읽다 보면 자주 목이 막힌다. 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눈들 때문에 속도가 저절로 빨라지다 보면 말이 꼬이기도 한다. 막상 축관을 맡으니 긴장이 되었다. 얼른 축문 첫 장을 살펴보았다. 촘촘히 박힌 축문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움찔거렸다.
제례 의식이 시작되고 내가 독축(讀祝)을 할 차례였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 신위 한 신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차츰 속도를 더해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신위가 눈에 띄었다. 그렇게 찾았던, 공공용지에 쓰여있던, 문제의 그 함자였다. 순서를 봤을 때 고조부 항렬쯤 되어 보였다. 얼른 페이지를 기억하고 다음 차례를 읽었다. 또 한참 속력을 내어 읽는데 아, 아버지 신위가 떡하니 나왔다. ‘현조고 학생 상철 부군 신위’. 연이어 어머니의 신위를 읽는데 왠지 울컥, 목이 멨다. 나를 빤히 쳐다보며 생전에 자주 했던 말씀이 들리는 듯했다.
“아들아! 시골에 전화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뭔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읽는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 얼른 머리를 흔들어 몰려드는 자괴심을 떨쳐버렸다. 겨우 축문 읽기를 끝냈다. 옆에 있던 제관이 고생했다며 생수병을 열어 주었다.
제례 의식을 다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집안사람들과 식사하며 술 한 잔 마시며 얘기를 꽃피울 시간이었다. 나는 얼른 외워두었던 축문 페이지를 펼쳤다. 이○흥, 21세 손, 1841년생이었다. 아득한 시간이 머릿속으로 흘러갔다. 시기로 봤을 때 중국 아편전쟁,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던 그즈음이었다. 어릴 때 밭 가에 묵정 묘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있었던 것도 생각났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의 200년이 지난 시점에 모습을 드러냈을까 궁금했다. 결국 그 필지는 공공용지 보상받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다려야만 한다.
고향에 갔다 올 때마다 기일이면 한 번씩 세장당을 찾자는 생각은 그때만 잠깐 유효하고 만다. 올해 어머니 기일에도 멀리 고향을 향해 머리만 숙이고 말 것이다. 이번에는 혹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그 조상을 잠깐 머릿속에서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 오랜 시간 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세장당에는 300구에 가까운 신위가 모셔져 있다. 당연히 참석하는 후손들도 많다. 하지만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 의례를 도와주는 제관들을 서로 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에는 축문을 읽는 축관이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급하게 내게 축문을 읽는 일이 맡겨졌다. 축관은 축문에 ‘현조고 학생 ○○ 부군 신위’라 쓰인 것을 300번 가까이 읽어야 한다. 축관이 혼자 읽을 때 나머지 후손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읽다 보면 자주 목이 막힌다. 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눈들 때문에 속도가 저절로 빨라지다 보면 말이 꼬이기도 한다. 막상 축관을 맡으니 긴장이 되었다. 얼른 축문 첫 장을 살펴보았다. 촘촘히 박힌 축문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움찔거렸다.
제례 의식이 시작되고 내가 독축(讀祝)을 할 차례였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 신위 한 신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차츰 속도를 더해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신위가 눈에 띄었다. 그렇게 찾았던, 공공용지에 쓰여있던, 문제의 그 함자였다. 순서를 봤을 때 고조부 항렬쯤 되어 보였다. 얼른 페이지를 기억하고 다음 차례를 읽었다. 또 한참 속력을 내어 읽는데 아, 아버지 신위가 떡하니 나왔다. ‘현조고 학생 상철 부군 신위’. 연이어 어머니의 신위를 읽는데 왠지 울컥, 목이 멨다. 나를 빤히 쳐다보며 생전에 자주 했던 말씀이 들리는 듯했다.
“아들아! 시골에 전화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뭔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읽는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 얼른 머리를 흔들어 몰려드는 자괴심을 떨쳐버렸다. 겨우 축문 읽기를 끝냈다. 옆에 있던 제관이 고생했다며 생수병을 열어 주었다.
제례 의식을 다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집안사람들과 식사하며 술 한 잔 마시며 얘기를 꽃피울 시간이었다. 나는 얼른 외워두었던 축문 페이지를 펼쳤다. 이○흥, 21세 손, 1841년생이었다. 아득한 시간이 머릿속으로 흘러갔다. 시기로 봤을 때 중국 아편전쟁,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던 그즈음이었다. 어릴 때 밭 가에 묵정 묘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있었던 것도 생각났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거의 200년이 지난 시점에 모습을 드러냈을까 궁금했다. 결국 그 필지는 공공용지 보상받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다려야만 한다.
고향에 갔다 올 때마다 기일이면 한 번씩 세장당을 찾자는 생각은 그때만 잠깐 유효하고 만다. 올해 어머니 기일에도 멀리 고향을 향해 머리만 숙이고 말 것이다. 이번에는 혹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그 조상을 잠깐 머릿속에서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 오랜 시간 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