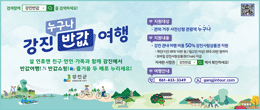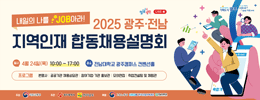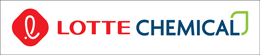[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상징으로 보는 세상 - 김낭예 지음
잠이 안 올 때 사람들은 왜 양을 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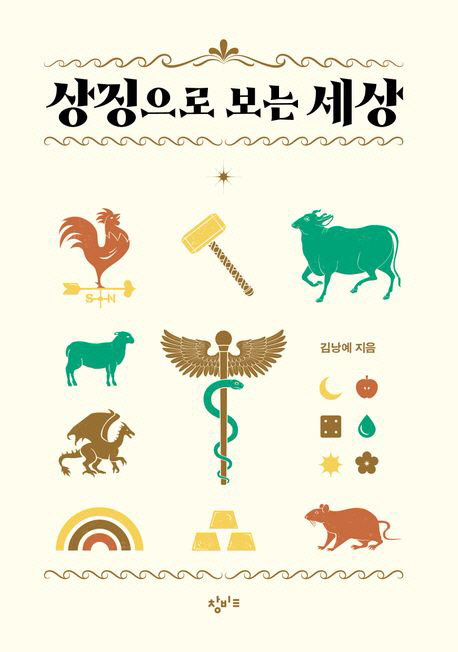 |
한번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잠을 못 이루는 주인공이 양을 세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어린 시절 잠이 안와서 뒤척이면 양을 세 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을 세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영어 단어 ‘sheep’(양)과 ‘sleep’(잠)의 발음이 비슷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양을 세는 반복이 여타의 잡념을 없애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양을 떠올리면 드넓은 푸른 초원이 떠오른다.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무리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더욱이 양털은 푹신함과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숙면과 연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꿈을 꾸면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이성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양을 잡으려 했는데 그만 뿔과 꼬리가 빠져 놓쳐 버린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는데,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는다. 이성계는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놓쳤는데, 어떻게 왕이 되는 꿈이냐며 믿지 않는다. 무학대사는 ‘양’(羊)에서 뿔과 꼬리가 떨어졌으니 ‘왕’(王)이 된다고 풀이해준다.
이렇듯 양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김낭예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가 펴낸 ‘상징으로 보는 세상’은 상징을 모티브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모든 이야기는 상징으로 통한다’는 것. 그동안 저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동물 상징 교육 내용 연구’ 등의 논문을 집필했고 SERIPro에서 강의하는 ‘상징의 문화사’는 누적 조회수 3만6000회를 넘었다.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사물은 돌하르방이다. 그러나 말로 상징을 설명해보라 하면 쉽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상징’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물건 따위”로 풀이돼 있다. 한자로 ‘상징’(象徵)은 ‘코끼리 상(象)’에 ‘부를 징(徵)’으로 표기된다. 말 그대로 ‘코끼리로 부른다’이다. 즉 ‘상’이라는 글자를 코끼리로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자가 만들어진 중국에서도 코끼리는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 희귀하다 보니 실제 모습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코끼리의 긴 코와 큰 귀를 본뜬 글자를 만들어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코끼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은 일견 타당하다.
또 다른 상징의 예를 보자. 마블 영화의 영웅 중에서 토르는 인기 있는 캐릭터다. 원래는 북유럽 신화의 최고의 신 오딘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옛날 북유럽 사람들은 토르가 마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면 천둥이 치고 묠니르를 세게 내던지면 번개가 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엄청난 무게의 망치를 가볍게 휘두르는 토르는 절대적인 존재다. 묠니르는 토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망치로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반고도 “하늘을 만들 때 망치를 썼다”는 전설상의 주인공이다. 반고는 천지개벽 이후 세상에 나왔다는 전설상의 천자인데 “망치의 강력한 힘이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과 왕권까지 상징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도 망치를 사용했다. 불의 신이기도 한 그는 불과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그의 망치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을 상징한다.
이밖에 책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쩌다 허니로 부르게 되었을까?’, ‘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왜 부자가 된다고 할까?’, ‘블루와 푸른색은 무엇이 다르를까?’ 등 상징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풍향계 위의 닭은 사람들을 깨우쳐 교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사진 왼쪽), 민화 속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상징한다. <창비 제공>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영어 단어 ‘sheep’(양)과 ‘sleep’(잠)의 발음이 비슷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양을 세는 반복이 여타의 잡념을 없애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풍향계 위의 닭은 사람들을 깨우쳐 교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상징한다. <창비 제공> |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모든 이야기는 상징으로 통한다’는 것. 그동안 저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동물 상징 교육 내용 연구’ 등의 논문을 집필했고 SERIPro에서 강의하는 ‘상징의 문화사’는 누적 조회수 3만6000회를 넘었다.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사물은 돌하르방이다. 그러나 말로 상징을 설명해보라 하면 쉽지 않다.
 민화 속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상징한다. <창비 제공> |
저자에 따르면 한자가 만들어진 중국에서도 코끼리는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 희귀하다 보니 실제 모습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코끼리의 긴 코와 큰 귀를 본뜬 글자를 만들어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코끼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은 일견 타당하다.
또 다른 상징의 예를 보자. 마블 영화의 영웅 중에서 토르는 인기 있는 캐릭터다. 원래는 북유럽 신화의 최고의 신 오딘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옛날 북유럽 사람들은 토르가 마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면 천둥이 치고 묠니르를 세게 내던지면 번개가 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엄청난 무게의 망치를 가볍게 휘두르는 토르는 절대적인 존재다. 묠니르는 토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망치로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반고도 “하늘을 만들 때 망치를 썼다”는 전설상의 주인공이다. 반고는 천지개벽 이후 세상에 나왔다는 전설상의 천자인데 “망치의 강력한 힘이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과 왕권까지 상징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도 망치를 사용했다. 불의 신이기도 한 그는 불과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그의 망치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을 상징한다.
이밖에 책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쩌다 허니로 부르게 되었을까?’, ‘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왜 부자가 된다고 할까?’, ‘블루와 푸른색은 무엇이 다르를까?’ 등 상징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풍향계 위의 닭은 사람들을 깨우쳐 교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사진 왼쪽), 민화 속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상징한다. <창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