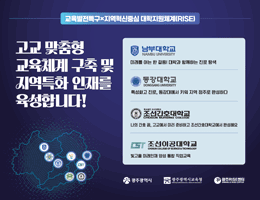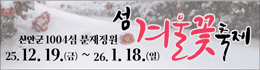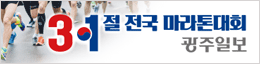설빔 -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설이나 추석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다녔던 19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10%도 못 되는 2000~3000달러에 불과했다. 서민들은 대부분 넉넉하지 못했고, 심지어 음식과 난방 부족으로 겨울철에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던 시기였다. 생필품이 부족해 모든 것을 아껴 쓰고, 물려 쓰는 게 당연한 시기였다.
막내 동생이 형들을 거쳐 내려온 내복까지 물려 입던 때였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도 설날 만큼은 자녀에게 새 옷을 사서 입히는 풍습이 있었다. 물론 당시는 성장기 자녀들의 신체를 감안해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진짜 내 옷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날이나 추석을 생일 이상으로 손꼽곤 했다.
설날 일주일 전쯤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새 옷을 사다 주시면, 한 번 입어 보고 며칠 동안 그대로 장롱에 보관한다. 설 전날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 입기 위해서 그동안 참는 것이다. 새 옷이 생기면 동시에 치러야 하는 고통스런 연례행사도 있다. 목욕이라는 표현으로는 많이 부족한, 온 몸의 때를 벗겨 내는 부모님의 이태리 타월 마사지를 견뎌 내야 했다. 설날 아침 세배를 마치고 시골에서 부딪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새 옷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하다.
이같이 설날에 입는 새 옷을 예로부터 설빔이라 불렀다. 설빔의 ‘빔’은 ‘꾸미다’라는 의미의 옛말인 ‘빗다’에서 온 말로, 빗다의 명사형인 ‘비’가 ‘빔’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설빔은 설에 꾸며 입은 옷이라는 뜻이다. 더불어 조상들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 위해 설 전에 목욕을 했다.
설날 아침 설빔을 입는 이유는 지난해의 일을 모두 떨쳐 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전통이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요즘, 옷이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달되는 세상이니 굳이 설빔을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졌다. 얼마 가지 않아 ‘설빔’이라는 단어는 잊혀지고,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고어가 될지도 모르겠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kwangju.co.kr
설날 일주일 전쯤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새 옷을 사다 주시면, 한 번 입어 보고 며칠 동안 그대로 장롱에 보관한다. 설 전날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 입기 위해서 그동안 참는 것이다. 새 옷이 생기면 동시에 치러야 하는 고통스런 연례행사도 있다. 목욕이라는 표현으로는 많이 부족한, 온 몸의 때를 벗겨 내는 부모님의 이태리 타월 마사지를 견뎌 내야 했다. 설날 아침 세배를 마치고 시골에서 부딪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새 옷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하다.
설날 아침 설빔을 입는 이유는 지난해의 일을 모두 떨쳐 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전통이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요즘, 옷이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달되는 세상이니 굳이 설빔을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어졌다. 얼마 가지 않아 ‘설빔’이라는 단어는 잊혀지고,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고어가 될지도 모르겠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