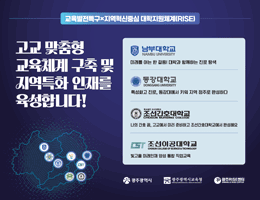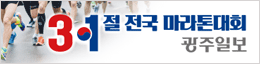광주에 초고층 ‘트윈타워’가 들어선다면
 |
지난달 중순, 광주동구예술여행센터는 한국여행작가협회와 공동으로 동구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명성을 얻고 있는 여행작가 20여 명은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 광주폴리 등을 둘러 보며 동구의 숨겨진 매력을 체험했다. 얼마 후, 동구예술여행센터가 팸투어를 마친 이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광주폴리’를 꼽았기 때문이다. 다른 장소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폴리가 외지인들의 눈에는 광주의 색깔을 지닌 공간으로 비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폴리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차별성과 정체성이다. 피터 아이젠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건축조형물인 폴리는 국내외에서는 보기 힘든 광주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쇠락한 구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 일환으로 옛 광주읍성터에 10개가 들어선 이후 광주의 정체성과 공간개념을 도입한 2차 폴리,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한 3차 폴리까지 30여 개가 동구와 광주시 전역에 설치됐다. 이같은 폴리의 변신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떠올랐고, 3차 광주폴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근 광주 문화계 일각에서 때아닌 ‘랜드마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공약 시민토론회’에서 외국의 유명 건물을 본뜬, 정체성이 모호한 랜드마크 구축사업들이 광주시의 대선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구와 광산구에 추진하는 ‘트윈타워’다. 1962년 미국 시애틀의 세계박람회 유산으로 건립된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184m)보다 더 아름다운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상하이의 동방명주, 파리의 에펠탑 등 외국의 도시에는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각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효과를 노린 랜드마크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공약에 맞춰 광주시가 공을 들이는 ‘트윈타워’는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정체성이다. 과연 이 거대한 쌍둥이 타워가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특히 근래 랜드마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때 하늘을 찌를듯한 건축물이 대세였지만 막대한 비용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변경관과 시민소통을 배려하는 ‘공적 공간’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폐선부지를 ‘문화적으로’ 되살려낸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나 수명다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그런 경우다.
만약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찾는다면 광주의 거리를 찬찬히 돌아보라. 폐선부지에 문화를 접목한 ‘푸른길’에서 부터 세계적 거장의 조형물인 30여 개의 광주폴리 등 숨겨진 보석들이 많다. 중요한 건 잠재력 있는 ‘구슬’을 발견해 가치를 부여하고 ‘브랜드’로 키우는 시의 의지와 관심이다. 어쩌면 ‘광주다운’ 랜드마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지 모른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2011년 쇠락한 구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 일환으로 옛 광주읍성터에 10개가 들어선 이후 광주의 정체성과 공간개념을 도입한 2차 폴리,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한 3차 폴리까지 30여 개가 동구와 광주시 전역에 설치됐다. 이같은 폴리의 변신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떠올랐고, 3차 광주폴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최근 광주 문화계 일각에서 때아닌 ‘랜드마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전남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공약 시민토론회’에서 외국의 유명 건물을 본뜬, 정체성이 모호한 랜드마크 구축사업들이 광주시의 대선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구와 광산구에 추진하는 ‘트윈타워’다. 1962년 미국 시애틀의 세계박람회 유산으로 건립된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184m)보다 더 아름다운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상하이의 동방명주, 파리의 에펠탑 등 외국의 도시에는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각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효과를 노린 랜드마크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공약에 맞춰 광주시가 공을 들이는 ‘트윈타워’는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정체성이다. 과연 이 거대한 쌍둥이 타워가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특히 근래 랜드마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때 하늘을 찌를듯한 건축물이 대세였지만 막대한 비용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변경관과 시민소통을 배려하는 ‘공적 공간’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폐선부지를 ‘문화적으로’ 되살려낸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나 수명다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그런 경우다.
만약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찾는다면 광주의 거리를 찬찬히 돌아보라. 폐선부지에 문화를 접목한 ‘푸른길’에서 부터 세계적 거장의 조형물인 30여 개의 광주폴리 등 숨겨진 보석들이 많다. 중요한 건 잠재력 있는 ‘구슬’을 발견해 가치를 부여하고 ‘브랜드’로 키우는 시의 의지와 관심이다. 어쩌면 ‘광주다운’ 랜드마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지 모른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