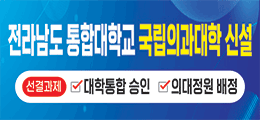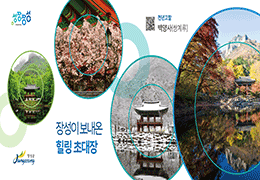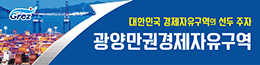<19> 남도에선 문화가 일상이고 예술이 삶이다
<제3부> 전라도, 문화예술 꽃피우다 ② 남종화, 수묵비엔날레로 부활
학포 양팽손·공재 윤두서 조선 회화의 큰 줄기 남종화 씨앗 틔우고
소치 허련 운림산방 가꿔 미산·남농 이어지는 호남화단 종가 이뤄
진도는 수묵의 본향·목포는 수묵이 한반도 전체로 뻗어나가는 거점
학포 양팽손·공재 윤두서 조선 회화의 큰 줄기 남종화 씨앗 틔우고
소치 허련 운림산방 가꿔 미산·남농 이어지는 호남화단 종가 이뤄
진도는 수묵의 본향·목포는 수묵이 한반도 전체로 뻗어나가는 거점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직접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꾼 진도 운림산방. 첨찰산 아래 단아한 운림산방은 그 자체가 한 폭의 산수화다.
/진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가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꺼내놓으면서 ‘답사 신드롬’을 일으킨 구절이다. 반론도 있다. ‘보는 만큼 안다’는 주장이다. 잘 알지 못해도 가서 보면 보인다는 것이다.
진도에 가면 후자를 실감한다. 다방이나 술집, 여느 가게를 가더라도 벽에 그림 한 두 점 걸리지 않은 곳이 없고, 딱히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타고난 신명과 흥으로 소리 한 대목쯤은 멋드러지게 해낸다. 문화가 일상이고, 예술이 숨 쉬는 동네다.
지난해 이곳 진도와 목포에서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열렸다. 수묵비엔날레는 전통회화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국제미술행사다. 진도와 목포를 잇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꾸민 열린 축제였다.
진도는 남종화의 화맥이 시작된 수묵의 본향이요, 목포는 수묵이 한반도 전체로 뻗어나간 전초기지다. 또 진도는 전통이요, 목포는 현대다. 한반도 맨 끝이지만, 진도와 목포에서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열린 까닭이다.
국제수묵비엔날레 초대 총감독을 맡았던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는 “‘수묵’을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유력한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엔날레라는 형식을 통해 선전하고 발전시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며 “더불어 수묵이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쓰임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창설 의미를 밝혔다.
◇호남 화단의 선구자 ‘학포 양팽손’
호남은 조선후기 회화의 큰 줄기인 남종화의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운 곳이다. 추사의 애제자인 소치 허련이 남종화의 종가(宗家)를 이뤘다. 선구자는 학포(學圃) 양팽손과 공재(恭齋) 윤두서다.
양팽손은 화순 능주 출신으로 문인이면서 선비화가였다. 안견의 화풍을 물려받아 편파구도의 양식을 보이는가 하면 한국적 준법으로 해석되는 단선점준(短線點준·가늘고 뾰족한 붓끝을 화면에 살짝 대어 끌거나 점을 찍듯이 하여 짧은 선·점의 향태를 이룬 준법)의 특성을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의 ‘산수도’가 남아있다.
그는 중종 11년 문과에 급제해 조광조와 더불어 교분을 갖다가 기묘사화에 연루, 벼슬길이 끊겼고 이후 대부분의 생을 고향에서 보냈다. 양팽손과 조광조의 우정은 500년이 훌쩍 넘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38세에 능주로 유배갈 때 양팽손도 그를 두둔하다 파직돼 낙향했다. 양팽손은 자신의 고향으로 유배 온 조광조를 다시 만난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경론을 탐구했지만, 끝내 중종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다. 조광조는 유배된 지 35일 만에 사약을 받고 능주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 때 옆에 함께 있었던 이가 양팽손이다. ‘임금을 어버이 같이 사랑하고 / 나라 걱정을 내 집 같이 하였도다 / 밝고 밝은 햇빛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훤하게 비춰주리라’ 조광조의 절명시다. 그는 또 “내가 죽거든 관으로 쓸 나무는 얇은 것으로 하라. 두껍고 무거운 송판을 쓰면 먼 길 가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가 죽자 양팽손은 그의 시신을 거둬 섣달의 매서운 눈보라를 헤치고 자신의 고향 뒷산에 묘를 썼다. 시신은 이듬해 봄, 용인 수지의 조광조 고향으로 이장했고, 양팽손은 그의 시신을 장사했던 언덕아래에 죽수사(竹樹祠)를 지어 봄·가을 제사를 지냈다. 조광조에 대한 의리였다. 이같은 인연으로 용인 수지의 심곡서원과 화순의 죽수서원은 매년 향사를 하며 교류하고 있다.
◇얼굴뿐 아니라 인품까지…‘공재 윤두서’
매섭게 올라간 눈꼬리, 굳게 다문 입술, 한 올 한 올 셀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진 수염…. 어찌나 묘사가 생생한 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매섭고 근엄해 100만을 호령할 것 같은 얼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난다.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보 240호,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그의 자화상을 두고 벗이었던 담헌 이하곤은 “육척도 되지 않는 몸으로 사해를 초월하려는 뜻이 있네. 긴 수염 나부끼는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저 진실로 자신을 양보하는 기품은 무릇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네.”라고 평했다. 또 남태응은 ‘청죽화사’에서 “마음의 눈으로 궤뚫어 본 다음 실득(實得)에야 붓을 들었다”고 했다.
조선시대 인물화는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 便是他人·일호불사 변시타인), 나아가 ‘정신까지 드러나야 한다’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정신 위에서 그려졌다.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과는 결이 다르다.
이 그림은 서울의 대형 박물관이 아닌 남도 끝 해남의 해남윤씨 종택 녹우당(고산 윤선도 유적지) 유물전시관에 있다. 왜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있을까. 그 것은 윤두서가 윤선도의 증손자이기 때문이다. 녹우(綠雨)는 ‘녹색의 비’다. 이를 두고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진 때 내리는 비’라고도 하고, 종택 뒤편 비자나무 숲에 바람이 불 때 ‘쏴아’ 하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도 한다.
그는 고산의 증손으로 ‘남인’이라는 당파가 평생 멍에가 되고 족쇄가 됐다.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예술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윤두서의 예술은 전통에 바탕을 둔 변화의 추구였고, 삶을 통해 깨달은 철학의 세계였다. 나아가 예술뿐 아니라 실학에도 눈을 뜨게 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정약용의 외증조다.
유물전시관에는 ‘자화상’ 말고도, 나무에 매어 놓은 살찐 말을 그린 ‘백마도’, 격렬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용을 그린 ‘수룡도’, 먹구름을 몰고 오는 용의 모습을 부채에 생동감 있게 그린 ‘희룡행우도’ 등 윤두서의 작품이 여럿 있다.
특히 조선 후기 회화사를 선도한 자연과 조화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그린 ‘풍속화’가 살갑다. 서민의 노동을 천시했던 신분제 사회이자, 산수화의 관념적 화풍이 득세했던 조선시대에 서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다. 전시관에는 나물을 캐는 아낙네, 밭을 가는 농부, 짚신을 삼는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윤두서가 남기고 간 이런 그림들은 반세기 지나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으로 승화됐다.
호남 회화사를 놓고 보면 윤두서의 예술적 감성은 아들 윤덕희를 거쳐 손자 윤용으로 이어졌다. 훗날 남종화의 계승자인 소치 허련도 녹우당에서 전통화풍을 익혔다. 한 사람의 뜨거운 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작품에 온기로 담기면서 남도의 예술적 전통과 맥을 이은 것이다.
◇남종화의 종조 ‘소치 허련’
해남 녹우당에서 우수영을 지나 진도대교를 건너면 진도다. 남도 회화사를 말할 때 진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운림산방 때문이다. 진도 첨찰산 아래 운림산방은 조선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도 녹우당 혜택을 봤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소치가 공재의 화첩과 장서를 만난 곳은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서였다. 일찍이 초의선사의 명성을 들은 소치는 20대 후반에 초의선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초의선사는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공재의 화첩과 장서를 가져다 서화를 가르쳤다. 추사 김정희도 그를 제자로 삼았다. 소치는 시·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42세에 헌종을 알현해 그림을 그리고, 왕실 소장 고서화를 품평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50세에 진도로 낙향한 그는 첨찰산 자락에 화실을 짓고 그림을 그렸다. 운림산방이다.
추사 김정희는 소치 그림에 대해 “화법이 심히 아름다우며, 우리 고유의 습성을 타파하여 압록강 이동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칭찬했다.
소치가 직접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꿨다는 운림산방은 소치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래 방치됐다가 손자 남농 허건이 사비를 들여 복원, 진도군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예술가의 타고난 감성 때문이었을까. 소치는 운림산방을 이름처럼 멋지고 운치있게 꾸몄다. 작은 집 앞에 널찍한 연못을 파고 한가운데 둥근 섬을 두고 백일홍 한 그루를 심었다. 여름이면 연못 가득한 수련과 함께 백일홍 붉은 꽃이 피어난다. 이 아름다운 연못은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에서 주인공들이 배를 띄워 노닐던 곳으로 등장한다.
운림산방에는 소치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소치 가문이 이어온 남종화의 계보와 작품을 소개한 전시관으로, 소치의 화맥을 잇는 아들 미산(米山) 허형, 손자 남농(南農) 허건·임인(林人) 허림, 증손 임전(林田) 허문으로 이어지는 한 집안의 그림 전통을 넘어 근대 호남 회화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해남·진도=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도에 가면 후자를 실감한다. 다방이나 술집, 여느 가게를 가더라도 벽에 그림 한 두 점 걸리지 않은 곳이 없고, 딱히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타고난 신명과 흥으로 소리 한 대목쯤은 멋드러지게 해낸다. 문화가 일상이고, 예술이 숨 쉬는 동네다.
진도는 남종화의 화맥이 시작된 수묵의 본향이요, 목포는 수묵이 한반도 전체로 뻗어나간 전초기지다. 또 진도는 전통이요, 목포는 현대다. 한반도 맨 끝이지만, 진도와 목포에서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열린 까닭이다.
 학포 양팽손의 ‘산수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호남 화단의 선구자 ‘학포 양팽손’
호남은 조선후기 회화의 큰 줄기인 남종화의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운 곳이다. 추사의 애제자인 소치 허련이 남종화의 종가(宗家)를 이뤘다. 선구자는 학포(學圃) 양팽손과 공재(恭齋) 윤두서다.
양팽손은 화순 능주 출신으로 문인이면서 선비화가였다. 안견의 화풍을 물려받아 편파구도의 양식을 보이는가 하면 한국적 준법으로 해석되는 단선점준(短線點준·가늘고 뾰족한 붓끝을 화면에 살짝 대어 끌거나 점을 찍듯이 하여 짧은 선·점의 향태를 이룬 준법)의 특성을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의 ‘산수도’가 남아있다.
그는 중종 11년 문과에 급제해 조광조와 더불어 교분을 갖다가 기묘사화에 연루, 벼슬길이 끊겼고 이후 대부분의 생을 고향에서 보냈다. 양팽손과 조광조의 우정은 500년이 훌쩍 넘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38세에 능주로 유배갈 때 양팽손도 그를 두둔하다 파직돼 낙향했다. 양팽손은 자신의 고향으로 유배 온 조광조를 다시 만난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경론을 탐구했지만, 끝내 중종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다. 조광조는 유배된 지 35일 만에 사약을 받고 능주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 때 옆에 함께 있었던 이가 양팽손이다. ‘임금을 어버이 같이 사랑하고 / 나라 걱정을 내 집 같이 하였도다 / 밝고 밝은 햇빛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훤하게 비춰주리라’ 조광조의 절명시다. 그는 또 “내가 죽거든 관으로 쓸 나무는 얇은 것으로 하라. 두껍고 무거운 송판을 쓰면 먼 길 가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가 죽자 양팽손은 그의 시신을 거둬 섣달의 매서운 눈보라를 헤치고 자신의 고향 뒷산에 묘를 썼다. 시신은 이듬해 봄, 용인 수지의 조광조 고향으로 이장했고, 양팽손은 그의 시신을 장사했던 언덕아래에 죽수사(竹樹祠)를 지어 봄·가을 제사를 지냈다. 조광조에 대한 의리였다. 이같은 인연으로 용인 수지의 심곡서원과 화순의 죽수서원은 매년 향사를 하며 교류하고 있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해남윤씨 종택 녹우당 소장> |
◇얼굴뿐 아니라 인품까지…‘공재 윤두서’
매섭게 올라간 눈꼬리, 굳게 다문 입술, 한 올 한 올 셀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진 수염…. 어찌나 묘사가 생생한 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매섭고 근엄해 100만을 호령할 것 같은 얼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난다.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보 240호,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그의 자화상을 두고 벗이었던 담헌 이하곤은 “육척도 되지 않는 몸으로 사해를 초월하려는 뜻이 있네. 긴 수염 나부끼는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저 진실로 자신을 양보하는 기품은 무릇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네.”라고 평했다. 또 남태응은 ‘청죽화사’에서 “마음의 눈으로 궤뚫어 본 다음 실득(實得)에야 붓을 들었다”고 했다.
조선시대 인물화는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 便是他人·일호불사 변시타인), 나아가 ‘정신까지 드러나야 한다’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정신 위에서 그려졌다.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과는 결이 다르다.
이 그림은 서울의 대형 박물관이 아닌 남도 끝 해남의 해남윤씨 종택 녹우당(고산 윤선도 유적지) 유물전시관에 있다. 왜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있을까. 그 것은 윤두서가 윤선도의 증손자이기 때문이다. 녹우(綠雨)는 ‘녹색의 비’다. 이를 두고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진 때 내리는 비’라고도 하고, 종택 뒤편 비자나무 숲에 바람이 불 때 ‘쏴아’ 하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도 한다.
그는 고산의 증손으로 ‘남인’이라는 당파가 평생 멍에가 되고 족쇄가 됐다.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예술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윤두서의 예술은 전통에 바탕을 둔 변화의 추구였고, 삶을 통해 깨달은 철학의 세계였다. 나아가 예술뿐 아니라 실학에도 눈을 뜨게 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정약용의 외증조다.
유물전시관에는 ‘자화상’ 말고도, 나무에 매어 놓은 살찐 말을 그린 ‘백마도’, 격렬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용을 그린 ‘수룡도’, 먹구름을 몰고 오는 용의 모습을 부채에 생동감 있게 그린 ‘희룡행우도’ 등 윤두서의 작품이 여럿 있다.
특히 조선 후기 회화사를 선도한 자연과 조화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그린 ‘풍속화’가 살갑다. 서민의 노동을 천시했던 신분제 사회이자, 산수화의 관념적 화풍이 득세했던 조선시대에 서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다. 전시관에는 나물을 캐는 아낙네, 밭을 가는 농부, 짚신을 삼는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윤두서가 남기고 간 이런 그림들은 반세기 지나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으로 승화됐다.
호남 회화사를 놓고 보면 윤두서의 예술적 감성은 아들 윤덕희를 거쳐 손자 윤용으로 이어졌다. 훗날 남종화의 계승자인 소치 허련도 녹우당에서 전통화풍을 익혔다. 한 사람의 뜨거운 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작품에 온기로 담기면서 남도의 예술적 전통과 맥을 이은 것이다.
◇남종화의 종조 ‘소치 허련’
해남 녹우당에서 우수영을 지나 진도대교를 건너면 진도다. 남도 회화사를 말할 때 진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운림산방 때문이다. 진도 첨찰산 아래 운림산방은 조선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도 녹우당 혜택을 봤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소치가 공재의 화첩과 장서를 만난 곳은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서였다. 일찍이 초의선사의 명성을 들은 소치는 20대 후반에 초의선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초의선사는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공재의 화첩과 장서를 가져다 서화를 가르쳤다. 추사 김정희도 그를 제자로 삼았다. 소치는 시·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42세에 헌종을 알현해 그림을 그리고, 왕실 소장 고서화를 품평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50세에 진도로 낙향한 그는 첨찰산 자락에 화실을 짓고 그림을 그렸다. 운림산방이다.
추사 김정희는 소치 그림에 대해 “화법이 심히 아름다우며, 우리 고유의 습성을 타파하여 압록강 이동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칭찬했다.
소치가 직접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꿨다는 운림산방은 소치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래 방치됐다가 손자 남농 허건이 사비를 들여 복원, 진도군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예술가의 타고난 감성 때문이었을까. 소치는 운림산방을 이름처럼 멋지고 운치있게 꾸몄다. 작은 집 앞에 널찍한 연못을 파고 한가운데 둥근 섬을 두고 백일홍 한 그루를 심었다. 여름이면 연못 가득한 수련과 함께 백일홍 붉은 꽃이 피어난다. 이 아름다운 연못은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에서 주인공들이 배를 띄워 노닐던 곳으로 등장한다.
운림산방에는 소치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소치 가문이 이어온 남종화의 계보와 작품을 소개한 전시관으로, 소치의 화맥을 잇는 아들 미산(米山) 허형, 손자 남농(南農) 허건·임인(林人) 허림, 증손 임전(林田) 허문으로 이어지는 한 집안의 그림 전통을 넘어 근대 호남 회화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해남·진도=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