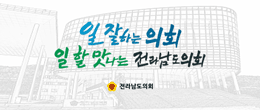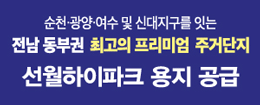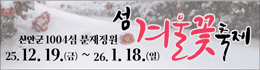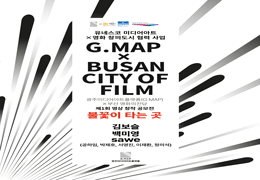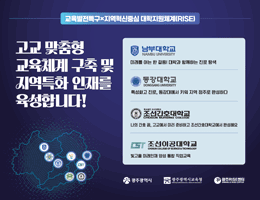마음이 이우는 까닭
 |
비가 내리면 좋겠다/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그 안에 담긴 씨앗들이 무사히 땅을 뚫고 나와/ 푸르게 이파리를 올리면 좋겠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 마당귀에서 뽀득뽀득 발을 씻고/ 마루에 올라앉아 하늘을 볼 것이다/ 집을 떠난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혹은 거리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그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썼던 날들의/ 노고를 어루만질 것이다//훠어이 훠어이/ 밭 귀퉁이 허수아비 그늘에 앉아/ 씨앗을 쪼려는 새들과 세상을 향해/ 땡볕의 검은 얼굴과 손으로/ 더 이상 손을 흔들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축축이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 갈 것이다/ 비가 내리면/ 할머니는 (졸시 ‘비가 내리면’ 전문)
제가 사는 시골에는 제 어머니를 닮은 할머니 몇 분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곧 마을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신 아드님이 큰 도시로 모시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사시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옮겨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과 같지 않을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실 것인지가 어쩐지 염려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 해 주더라도 노인들이 대도시에 살면서 느껴야만 하는 감정은 특별하게 마련이지요.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도무지 피하고 싶은, 가능하다면 겪고 싶지 않은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더욱이 떠나신다는 그 할머니는 지난 여름 콩밭의 새를 쫓기 위해 이녁이 만든 허수아비 그늘 밑에서 훠어이 훠어이, 손을 흔들며 한 계절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까짓 콩이 무어 대수냐고, 돈으로 따지면 몇 푼이나 되냐는 제 말에 할머니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이….” 라며 새카매진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의 삶을 헤아리며 이 시를 썼습니다. 노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더 어울리는 그 할머니의 감성을 생각하면 제 걱정이 마냥 기우라고만 할 수 없겠지요.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저를 보더니 감을 따 주겠노라고 구부정한 허리로 장대를 가져 오셨습니다. 커다란 감나무 밑 공터가 마을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상황을 예견치 못하고 그대로 차 옆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장대를 높이 드시더니 감나무 가지를 치셨습니다. 후두둑, 홍시들이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홍시들은 차창과 차 지붕, 제 머리 위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계란 프라이처럼 넓게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멋쩍은 듯 서 있다가 제 머리를 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우하하하. 그리고 “머리에 감이 떨어졌어, 꼭 파마한 것 같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저도 할머니를 따라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날 나는 도시를 떠나고 싶었던, 삶이 내게 짐 지워 무겁기만 했던 그때까지의 번민과 회한이 조금은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개울 건너에서 제 집 마당으로 감을 던지셨습니다. 어깨에 힘이 없어 팔꿈치 아래, 손과 팔목만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던지시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던 기억들이 동화처럼 아련합니다. 할머니는 그처럼 우리의 시골살이를 안착시켜 준 가이드셨네요. 할머니의 이사는 지난해 병환으로 서울 아들집에 가셨다가 주검으로 돌아오신 또 다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제 마음을 겨울 새벽처럼 침울하게 합니다.
이렇듯 어느 것 하나 단순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니. “모든 것들은 오고 가고 또 온다.”는 카프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저녁놀처럼 이웁니다. 아무쪼록 할머니가 어디서건 오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날 나는 도시를 떠나고 싶었던, 삶이 내게 짐 지워 무겁기만 했던 그때까지의 번민과 회한이 조금은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개울 건너에서 제 집 마당으로 감을 던지셨습니다. 어깨에 힘이 없어 팔꿈치 아래, 손과 팔목만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던지시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던 기억들이 동화처럼 아련합니다. 할머니는 그처럼 우리의 시골살이를 안착시켜 준 가이드셨네요. 할머니의 이사는 지난해 병환으로 서울 아들집에 가셨다가 주검으로 돌아오신 또 다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제 마음을 겨울 새벽처럼 침울하게 합니다.
이렇듯 어느 것 하나 단순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니. “모든 것들은 오고 가고 또 온다.”는 카프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저녁놀처럼 이웁니다. 아무쪼록 할머니가 어디서건 오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