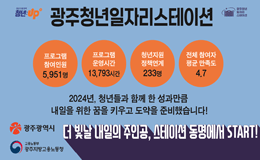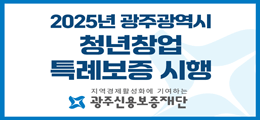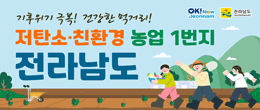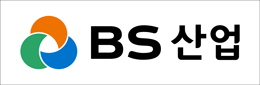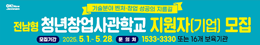그 시대엔 ‘어른’이 있었다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
“어른이 없다.” 언제부턴가 지역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어른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다 자란 사람’이나 ‘나이나 지위나 항렬이 높은 윗사람’으로 풀이한다. ‘한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어른은 맨 마지막 의미일 게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이 희미하게 남아 있긴 하지만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우대받거나 존경받기를 기대하긴 힘든 시대다. 원로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다. 경험과 지식의 전수를 인터넷이 대신하고 공동체보다 개인이 대세인 시대다. 지난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어른 없는 시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93%에 이르렀다.
광주의 의인 홍남순·조아라
상황이 이러한지라 지역 현안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얽혀도 마땅한 조정자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대중의 의식을 이끌어 줄 정신적 지주는 보이지 않는다. 부조리와 부당함에 맞서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원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없다’는 말은 이런 세태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탄식이다.
그 시대엔 어른이 있었다. 이 땅의 민초들이 서슬 퍼런 독재의 탄압에 신음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절, 그 대열의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고 홍남순 변호사와 조아라 여사가 대표적이다. 두 분의 삶은 닮은꼴이다. 1912년 같은 해에 태어나 일제 치하와 군부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는 질곡의 현대사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며 90여 평생 동안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실천했다. 말보다 온몸으로, 청빈한 삶으로 어른다움을 보여 준 ‘시대의 의인’이었다.
지난달 14일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홍 변호사의 1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홍 변호사는 ‘어둠의 시대에는 법보다 양심이 앞선다’는 신념으로 양심수들을 위해 60여 건의 무료 변론을 펼친 1세대 인권변호사였다. 1965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 1973년 함성지 사건, 1976년 3·1 구국선언 명동 사건, 1978년 교육지표 사건 등 시국 사건 법정에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수습 대책 위원으로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죽음의 행진’을 이끌었고 신군부에 의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이후에도 광주민중항쟁 위령탑 건립 등 5·18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1986년에는 전남 민주회복 국민협의회를 결성해 6월 항쟁을 이끈 국본(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조직적 토대를 제공했다.
조아라 여사 역시 여성과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민주화·인권 운동에 헌신한 사회운동가였다. 1931년 수피아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신사 참배 및 창씨개명 거부와 관련 두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에는 광주YWCA 총무·회장을 거쳐 명예 회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40여 년 간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성빈여사와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 청소년 야학인 별빛학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계명여사를 잇따라 세워 여성 교육을 선도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왔다. 5·18 당시에는 홍 변호사 등과 함께 수습 대책 위원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에 끌려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출감 후에도 부상자와 유가족들을 돌보는 데 힘써 ‘민주화 운동의 대모’ ‘광주의 어머니’로 불렸다.
방치된 지역 민주주의 역사
지난 주말 홍남순 변호사 자택과 조아라 여사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사직도서관 아래, 그가 좋아했던 백일홍 정원과 함께 조성돼 있었다. 유물 전시관과 사진 전시관에서는 그의 생전 모습과 활동을 사진과 유품을 통해 생생히 만날 수 있었다. 광주YWCA는 기념관 건립은 물론 생애를 재조명하는 연극을 2일 무대에 올리는 등 기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 동구 궁동 15-1번지 전남여고 건너편에 위치한 홍 변호사의 자택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낡은 건물 지붕에는 새는 빗물을 막기 위해 장판 조각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회색 천막이 씌워진 채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마당을 지켰을 은행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 집은 1953년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거처로 삼은 이후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다. 박정희 독재 정권 반대 투쟁의 호남 거점이었고, 5·18 때는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문병란 시인이 ‘취영송’(翠英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 쉬는 민주주의 대법정’이라고 노래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집은 홍 변호사가 타계한 이후 후손들이 빚을 못 이겨 제 3자에게 이전됐고 지금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의인(義人) 홍남순’ 기획 시리즈를 통해 그의 삶을 재조명하며 자택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행히 광주시가 지난 9월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안내문 하나 없고,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역사적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민주의 집’으로 복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른 부재의 시대에, 지역의 큰 어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삶을 기리고 되돌아보며, 새 시대의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광주의 의인 홍남순·조아라
상황이 이러한지라 지역 현안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얽혀도 마땅한 조정자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대중의 의식을 이끌어 줄 정신적 지주는 보이지 않는다. 부조리와 부당함에 맞서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원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없다’는 말은 이런 세태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탄식이다.
지난달 14일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홍 변호사의 1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홍 변호사는 ‘어둠의 시대에는 법보다 양심이 앞선다’는 신념으로 양심수들을 위해 60여 건의 무료 변론을 펼친 1세대 인권변호사였다. 1965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 1973년 함성지 사건, 1976년 3·1 구국선언 명동 사건, 1978년 교육지표 사건 등 시국 사건 법정에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수습 대책 위원으로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죽음의 행진’을 이끌었고 신군부에 의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이후에도 광주민중항쟁 위령탑 건립 등 5·18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1986년에는 전남 민주회복 국민협의회를 결성해 6월 항쟁을 이끈 국본(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조직적 토대를 제공했다.
조아라 여사 역시 여성과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민주화·인권 운동에 헌신한 사회운동가였다. 1931년 수피아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신사 참배 및 창씨개명 거부와 관련 두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에는 광주YWCA 총무·회장을 거쳐 명예 회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40여 년 간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성빈여사와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 청소년 야학인 별빛학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계명여사를 잇따라 세워 여성 교육을 선도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왔다. 5·18 당시에는 홍 변호사 등과 함께 수습 대책 위원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에 끌려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출감 후에도 부상자와 유가족들을 돌보는 데 힘써 ‘민주화 운동의 대모’ ‘광주의 어머니’로 불렸다.
방치된 지역 민주주의 역사
지난 주말 홍남순 변호사 자택과 조아라 여사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사직도서관 아래, 그가 좋아했던 백일홍 정원과 함께 조성돼 있었다. 유물 전시관과 사진 전시관에서는 그의 생전 모습과 활동을 사진과 유품을 통해 생생히 만날 수 있었다. 광주YWCA는 기념관 건립은 물론 생애를 재조명하는 연극을 2일 무대에 올리는 등 기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 동구 궁동 15-1번지 전남여고 건너편에 위치한 홍 변호사의 자택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낡은 건물 지붕에는 새는 빗물을 막기 위해 장판 조각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회색 천막이 씌워진 채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마당을 지켰을 은행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 집은 1953년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거처로 삼은 이후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다. 박정희 독재 정권 반대 투쟁의 호남 거점이었고, 5·18 때는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문병란 시인이 ‘취영송’(翠英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 쉬는 민주주의 대법정’이라고 노래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집은 홍 변호사가 타계한 이후 후손들이 빚을 못 이겨 제 3자에게 이전됐고 지금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의인(義人) 홍남순’ 기획 시리즈를 통해 그의 삶을 재조명하며 자택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행히 광주시가 지난 9월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안내문 하나 없고,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역사적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민주의 집’으로 복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른 부재의 시대에, 지역의 큰 어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삶을 기리고 되돌아보며, 새 시대의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