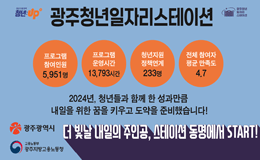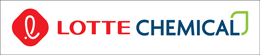이 나라를 아십니까
정 후 식
논설실장·이사
논설실장·이사
 |
‘행복의 나라’ 택시운전사 카르마에게 물었다. “얼마나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잠시도 망설임 없이 답변이 돌아왔다. “늘 행복해요(Happy all the time)” 시장 상인 노르부나 가이드인 도르지의 응답도 한결같다. 약속이나 한 듯하다. 되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눈빛이다.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들의 반응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 부와 소득의 양극화, 금수저·흙수저 논쟁 속에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비명 섞인 자조가 터져 나오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을 혼란스럽게 한다.
부탄, 그들이 행복한 까닭은
치미는 욕망과 비움에 대한 갈망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성대는 마음을 다잡아 델리(Delhi)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젠 인도의 22번째 주(州)가 된 옛 시킴(Sikkim)왕국을 거쳐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Bhutan)왕국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서벵골 북부 고산 휴양지 다르질링 인근의 끝없이 펼쳐진 차밭과 히말라야 산맥 가장 동쪽에 위치한 칸첸중가(8586m) 산군의 장대한 파노라마는 덤이다. 엿새간의 부탄 내 여로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부 부탄으로 잡았다. 국제공항이 있는 파로(Paro)와 수도인 팀푸(Thimpu), 옛 수도인 푸나카(Punakha)를 오가는 평균 고도 2000m의 산악지대다.
가는 곳마다 불법과 진리가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에 퍼지라는 염원을 담은 오색 깃발 룽다가 펄럭인다. 깎아지른 절벽에 자리한 탁상 곰바를 비롯한 수많은 사원들, 석탑 초르텐, 기도 문구가 새겨진 원통형 바퀴 마니차를 따라 도는 주민 행렬은 티베트 불교 신도들의 믿음을 웅변한다.
잘 보존된 숲과 생태계에는 자연 사랑이 그득하다. 개발로 얻을 이득을 포기하고 산림 면적이 국토의 60%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하자원 채굴을 삼가고 도로 개설 때 터널도 뚫지 않는다. 이 같은 불심(佛心)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행복의 밑바탕일까.
인터뷰에 응한 부탄인들이 제시한 행복의 증표는 이렇다.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무상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객도 진료는 공짜다. 게다가 국왕이 오지 마을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세심히 돌봐 준다.” 촘촘한 복지 정책과 소통하며 헌신하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근원이라는 것이다.
인구 77만 명의 소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밑도는 부탄이 ‘행복 강대국’으로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972년 제4대 국왕인 지그메 싱게 왕축이 제안한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덕분이다. 경제적 발전만을 보여 주는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 남걀 왕축은 부왕의 뜻을 이어 2008년 이를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채택했다.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 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 등이 4대 축이다.
첫눈 내리는 날은 공휴일
그 결과 유럽신경제재단(NEF)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했다. 현 국왕은 나아가 ‘국가는 왕보다 중요하다’며 스스로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 헌법을 선포했다.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것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성은 ‘고’, 여성은 ‘키’라라는 고유 의상을 입고 모든 건물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따른다. 전통의 미덕은 끈끈한 공동체 문화에도 살아 숨 쉰다.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고이 지켜 온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부탄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느는 이유다. 정부는 여기에도 제어 장치를 뒀다. 하루 250달러의 체재비 규정이다. 이는 외국인 여행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낭만적이게도 부탄에 첫눈이 내리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다.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독특한 제도가 많다. 최근에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 실업과 범죄가 늘고 있다. 인접국 네팔로부터 밀려오는 난민도 사회적 문제다. K팝과 한국드라마를 즐기는 청바지 차림의 젊은이도 눈에 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부탄은 외모와 음식 등에서 닮은꼴이면서도 여러모로 대비된다. 부탄이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던 1970년대 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10배나 많다. 반면 국민행복지수는 부탄이 세계 최상위를, 성장 제일주의 무한 경쟁 사회인 한국은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지난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부탄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식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 삶의 질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존재 가치는 없다.” 국민행복지수를 제안한 부탄 국왕의 말이다. 그런 점에서 부탄과 한국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who@kwangju.co.kr
부탄, 그들이 행복한 까닭은
치미는 욕망과 비움에 대한 갈망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성대는 마음을 다잡아 델리(Delhi)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젠 인도의 22번째 주(州)가 된 옛 시킴(Sikkim)왕국을 거쳐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Bhutan)왕국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서벵골 북부 고산 휴양지 다르질링 인근의 끝없이 펼쳐진 차밭과 히말라야 산맥 가장 동쪽에 위치한 칸첸중가(8586m) 산군의 장대한 파노라마는 덤이다. 엿새간의 부탄 내 여로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부 부탄으로 잡았다. 국제공항이 있는 파로(Paro)와 수도인 팀푸(Thimpu), 옛 수도인 푸나카(Punakha)를 오가는 평균 고도 2000m의 산악지대다.
잘 보존된 숲과 생태계에는 자연 사랑이 그득하다. 개발로 얻을 이득을 포기하고 산림 면적이 국토의 60%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하자원 채굴을 삼가고 도로 개설 때 터널도 뚫지 않는다. 이 같은 불심(佛心)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행복의 밑바탕일까.
인터뷰에 응한 부탄인들이 제시한 행복의 증표는 이렇다.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무상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객도 진료는 공짜다. 게다가 국왕이 오지 마을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세심히 돌봐 준다.” 촘촘한 복지 정책과 소통하며 헌신하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근원이라는 것이다.
인구 77만 명의 소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밑도는 부탄이 ‘행복 강대국’으로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972년 제4대 국왕인 지그메 싱게 왕축이 제안한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덕분이다. 경제적 발전만을 보여 주는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 남걀 왕축은 부왕의 뜻을 이어 2008년 이를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채택했다.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 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 등이 4대 축이다.
첫눈 내리는 날은 공휴일
그 결과 유럽신경제재단(NEF)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했다. 현 국왕은 나아가 ‘국가는 왕보다 중요하다’며 스스로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 헌법을 선포했다.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것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성은 ‘고’, 여성은 ‘키’라라는 고유 의상을 입고 모든 건물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따른다. 전통의 미덕은 끈끈한 공동체 문화에도 살아 숨 쉰다.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고이 지켜 온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부탄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느는 이유다. 정부는 여기에도 제어 장치를 뒀다. 하루 250달러의 체재비 규정이다. 이는 외국인 여행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낭만적이게도 부탄에 첫눈이 내리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다.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독특한 제도가 많다. 최근에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 실업과 범죄가 늘고 있다. 인접국 네팔로부터 밀려오는 난민도 사회적 문제다. K팝과 한국드라마를 즐기는 청바지 차림의 젊은이도 눈에 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부탄은 외모와 음식 등에서 닮은꼴이면서도 여러모로 대비된다. 부탄이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던 1970년대 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10배나 많다. 반면 국민행복지수는 부탄이 세계 최상위를, 성장 제일주의 무한 경쟁 사회인 한국은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지난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부탄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식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 삶의 질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존재 가치는 없다.” 국민행복지수를 제안한 부탄 국왕의 말이다. 그런 점에서 부탄과 한국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w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