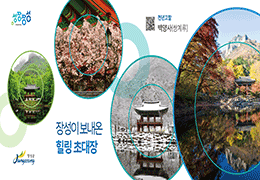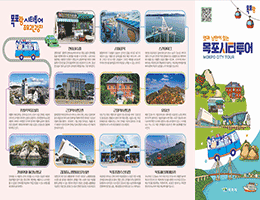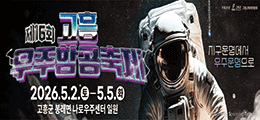[송광룡 시인·문학들 발행인] 지역 출판과 문예지를 보는 시각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산문작가협회 사무실에서 ‘문예지 지원 제도의 현황과 제언’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예지 ‘문학의오늘’과 ‘시작’ 그리고 ‘한국산문 편집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의 목적은 정부가 폐지한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었다.
우수 문예지와 문학 분야 주요 기관지의 원고료를 지원했던 이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문예지를 살리고 원고료를 지급하여 작가들의 생계를 돕는 역할을 해 왔다. 55개 문예지에 10억 원이 지원된 2014년에는 월간지에 3000만∼4000만 원, 계간지에 1000만∼2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해 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지난해 예산을 3억 원으로 깎고 지원 대상을 14곳으로 줄이더니 올해는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해 버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지원금이 끊기자 종합문예지 ‘세계의 문학’, 시 전문지 ‘유심’, 장애인 문학을 대표해 온 ‘솟대문학’ 등이 잇따라 폐간됐다. 머잖아 ○○, ×× 문예지들이 폐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자구책으로 책의 면수를 줄이거나 합본 호를 내는 곳도 있다. 작가나 독자에게 후원을 읍소하는 문예지도 적지 않게 됐다. 계간 ‘문학들’도 CMS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예술위’는 이 사업이 “문학적 성과와 무관하게 작가나 단체들이 기금 지원에만 의존하게 하고 (출판사의) 시장 개발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사업 폐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체 한 명의 작가가 한 해 동안 몇 편의 작품을 문예지에 발표하는지, 그 원고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해 보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그동안 지원받은 문예지들은 지원금을 원고료로 썼다는 증빙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했다. 지원받은 첫해부터 지원금 전체를 원고료로 지급했고, 그래도 부족해 적잖은 출혈을 해 온 ‘문학들’로서는 ‘예술위’의 입장이 못내 섭섭하다.
자생력을 잃어버린 시장에서 ‘시장 개발 의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예술위’의 태도에는 작가나 문예지가 공인이나 공공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책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책에 공공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책을 만드는 곳이 출판사고, 작품을 쓰는 이가 작가이며, 그 작품이 발표되는 지면이 바로 문예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도종환 의원은 “문예지의 활성화 없이 문학의 발전, 문화콘텐츠의 발전, 한류 문화의 발전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래의 산업이라 예감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예지와 작가를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보기보다는 공공재와 공인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같은 논리로, 지역출판사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4년 출판산업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4만4873개의 출판사 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6414개사(14.2%), 그나마 2013년 한 해 동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3933개사(8.7%) 뿐이었다. 그런가하면 2012년 기준 지역별 출판사 현황을 보면, 전체 3만9315업체 중 서울 2만4496개사(62.3%), 경기도 6307개사(16.0%), 인천 823개사(2.1%)로 수도권에 80% 가량의 출판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광주는 802개사(2.0%), 전남은 431개사(1.1%)였다.
문제는 그나마 20%를 차지하는 지역 출판사 중에서도 펴낸 책을 서점에 유통시키는 출판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단순 인쇄업이나 출판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저자의 글을 출판하여 독자가 서점을 통해 책을 만나는 선순환 체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 이래서는 지역의 문화나 지식, 혹은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 낼 길이 없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눈여겨보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속살을 더듬으며 어렵사리 고군분투하는 출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의 ‘한티재’, 홍성의 ‘그물코’, 청주의 ‘직지’, 통영의 ‘남해의봄날’, 하동의 ‘상추쌈’, 진주의 ‘펄북스’, 부산의 ‘산지니’, 제주의 ‘각’ 등등. 더 이상 중앙 바라기를 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역사를 책으로 엮어 내는 이들의 활약은 경이롭고도 아름답다.
지식과 문화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은 차이에 있다.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그 무엇은 그 지역만의 내밀한 속내를 알지 못하면 터득하기 어렵다. 중앙에서는 눈 돌릴 짬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지역의 문화와 지식과 콘텐츠를 살리려면 지역 출판사가 살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지역 출판과 지역 도서, 지역 독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결과는 참담했다. 지원금이 끊기자 종합문예지 ‘세계의 문학’, 시 전문지 ‘유심’, 장애인 문학을 대표해 온 ‘솟대문학’ 등이 잇따라 폐간됐다. 머잖아 ○○, ×× 문예지들이 폐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자구책으로 책의 면수를 줄이거나 합본 호를 내는 곳도 있다. 작가나 독자에게 후원을 읍소하는 문예지도 적지 않게 됐다. 계간 ‘문학들’도 CMS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생력을 잃어버린 시장에서 ‘시장 개발 의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예술위’의 태도에는 작가나 문예지가 공인이나 공공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책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책에 공공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책을 만드는 곳이 출판사고, 작품을 쓰는 이가 작가이며, 그 작품이 발표되는 지면이 바로 문예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도종환 의원은 “문예지의 활성화 없이 문학의 발전, 문화콘텐츠의 발전, 한류 문화의 발전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래의 산업이라 예감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예지와 작가를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보기보다는 공공재와 공인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다.
같은 논리로, 지역출판사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4년 출판산업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4만4873개의 출판사 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6414개사(14.2%), 그나마 2013년 한 해 동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3933개사(8.7%) 뿐이었다. 그런가하면 2012년 기준 지역별 출판사 현황을 보면, 전체 3만9315업체 중 서울 2만4496개사(62.3%), 경기도 6307개사(16.0%), 인천 823개사(2.1%)로 수도권에 80% 가량의 출판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광주는 802개사(2.0%), 전남은 431개사(1.1%)였다.
문제는 그나마 20%를 차지하는 지역 출판사 중에서도 펴낸 책을 서점에 유통시키는 출판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단순 인쇄업이나 출판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저자의 글을 출판하여 독자가 서점을 통해 책을 만나는 선순환 체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 이래서는 지역의 문화나 지식, 혹은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 낼 길이 없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눈여겨보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속살을 더듬으며 어렵사리 고군분투하는 출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의 ‘한티재’, 홍성의 ‘그물코’, 청주의 ‘직지’, 통영의 ‘남해의봄날’, 하동의 ‘상추쌈’, 진주의 ‘펄북스’, 부산의 ‘산지니’, 제주의 ‘각’ 등등. 더 이상 중앙 바라기를 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역사를 책으로 엮어 내는 이들의 활약은 경이롭고도 아름답다.
지식과 문화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은 차이에 있다.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그 무엇은 그 지역만의 내밀한 속내를 알지 못하면 터득하기 어렵다. 중앙에서는 눈 돌릴 짬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지역의 문화와 지식과 콘텐츠를 살리려면 지역 출판사가 살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지역 출판과 지역 도서, 지역 독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