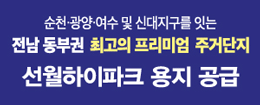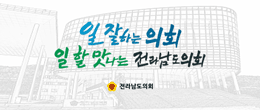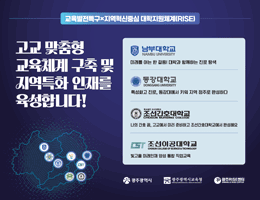‘샘터’ 40주년이 특별한 이유
“난 절대로 이 아기가 궁색하게는 키우지 않을 것이다. 썅, 맹세한다 맹세해. 나도 남들처럼 피아노를 배우게 할 것이다. 남들처럼 어린이 합창단에도 집어넣어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썅. 맹세한다.”(제1회 ‘아기’에서)
‘별들의 고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청년 작가 최인호는 월간지 ‘샘터’에 새 둥지를 틀었다. 1975년 9월, 그의 나이 스물아홉 살 때였다. 작가는 자신의 실제 생활을 모델로 연작소설 ‘가족’을 연재했다. 아내 ‘황정숙’은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달에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예쁘지 않으면 어떻게 데리고 살겠는 가마는 결혼을 하고 나니 사는 게 시들시들해지고 탄력성을 잃어가고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냅다 선하품이…”라고 아내의 속을 긁는가 하면 어떤 달에는 “나는 아내의 잔소리를 좋아한다”고 닭살멘트를 날렸다.
매월 그가 맛깔스럽게 풀어낸 이야기는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처럼 재미가 쏠쏠했다. 독자들은 ‘가족’을 통해 ‘다혜’와 ‘도단’이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도 지켜봤다. 해를 거듭하면서 최씨의 딸과 아들이 진짜 자신들의 ‘분신’인 것 같은 일체감을 느꼈다. 비록 원고지 20매 내외의 짤막한 에피소드였지만 내밀한 모습을 일기 쓰듯 진솔하게 그려내 그 어떤 장편 소설 못지 않은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35년 전 철없던 초보아빠 최씨는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겼다. 네살짜리 큰딸 다혜와 두 살배기 아들 도단이는 결혼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두 손녀 정원이와 윤정이도 ‘가족’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다.
소설은 2009년 10월 최씨가 건강상 이유로 연재를 마감하기까지 무려 34년 동안 402회가 실렸다. 200자 원고지 8천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 11일 입적한 법정스님 역시 최씨 못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감성을 적셨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고사순례(古寺巡禮)’를,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산방한담(山房閑談)’을 120여 개월간 연재해 각박한 세태에 청량제 역할을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교양지’를 표방한 월간지 ‘샘터’가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70년 4월 창간 때 샘터가 내세운 키워드는 ‘행복’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거짓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글에는 감동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았던 시절, ‘샘터’가 터를 잡자마자 자신의 글 한 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들었다. 미국에 이민 간 교포, 독일에 파견 간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역만리의 애환을 편지로 보내왔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독자들은 울고 웃었다. ‘샘터’는 삭막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준 오아시스였다.
최근 ‘조인트’니 ‘현모양처’니 일부 여권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막말과 독설이 난무하는 요즘, 여운과 감동을 주는 말과 글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별들의 고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청년 작가 최인호는 월간지 ‘샘터’에 새 둥지를 틀었다. 1975년 9월, 그의 나이 스물아홉 살 때였다. 작가는 자신의 실제 생활을 모델로 연작소설 ‘가족’을 연재했다. 아내 ‘황정숙’은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달에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예쁘지 않으면 어떻게 데리고 살겠는 가마는 결혼을 하고 나니 사는 게 시들시들해지고 탄력성을 잃어가고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냅다 선하품이…”라고 아내의 속을 긁는가 하면 어떤 달에는 “나는 아내의 잔소리를 좋아한다”고 닭살멘트를 날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교양지’를 표방한 월간지 ‘샘터’가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70년 4월 창간 때 샘터가 내세운 키워드는 ‘행복’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거짓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글에는 감동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았던 시절, ‘샘터’가 터를 잡자마자 자신의 글 한 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들었다. 미국에 이민 간 교포, 독일에 파견 간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역만리의 애환을 편지로 보내왔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독자들은 울고 웃었다. ‘샘터’는 삭막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준 오아시스였다.
최근 ‘조인트’니 ‘현모양처’니 일부 여권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막말과 독설이 난무하는 요즘, 여운과 감동을 주는 말과 글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다.
/박진현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