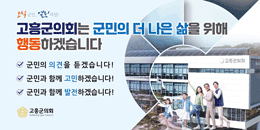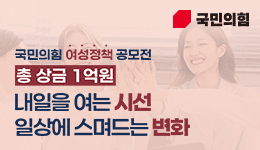18세기 호남학자 손재 박광일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
16세기의 호남학은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배출로 너무도 찬란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시문학에서도 호남의 문인들은 조선 문단을 장악할 정도로 우수한 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일재 이항, 하서 김인후, 미암 유희춘, 고봉 기대승, 사암 박순, 건재 김천일 등 탁월한 학자들이 호남학을 온 나라에 펼치면서 성리학의 논리가 세상을 이끌어 갔다. 그런 찬란한 학문적 축적은 끝내 의리의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말 임진왜란에는 호남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의병장으로 변신, 조국을 지키는 보루 구실을 해내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17~18세기에는 하서·고봉과 같은 수준의 학자가 나오지 않아 호남학이 매우 적막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나는 오래전에 ‘17~18세기 호남 유학의 전통’(‘한국한문학연구’21집, 1998)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17~18세기에도 호남학은 연면히 이어 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여 높은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논리 근거의 하나가 바로 17~18세기에 활동하여 학자로서의 업적이 탁월한 손재(遜齋) 박광일(朴光一:1655-1723) 선생이다.
고봉 기대승이 1572년 46세로 세상을 떠났고 손재가 탄생한 해는 1655년이니 그 사이가 83년으로 백여 년의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봉과 손재 사이에도 수은 강항, 우산 안방준, 고산 윤선도 등 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17세기에 활발하게 학문 활동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 정보가 어둡던 시대여서, 호남학은 하서와 고봉을 거쳐 100여 년 만에 손재가 태어나 학문을 이어 갔다는 주장을 편 학자들이 있었다.
당대의 학자 풍서(豊墅) 이민보(李敏輔:1720~1799)는 “호남학은 하서·고봉을 지나 백여 년 만에 손재 박공이 나왔다.(湖南之學 由河西高峯百有餘年 而故徵士遜齋朴公作焉)”(遜齋集跋)라고 말했고,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1776-1852) 또한 “호남학은 하서·고봉을 경유해 손재·목산(李基敬)에 이르고 또 위백규(魏伯珪) 공이 두 분을 이어 나왔다.(湖南之學 由河西高峯 而至于遜齋木山 公又殿兩賢而作 ··· ‘魏伯珪墓誌銘’)”라고 말하여 하서와 고봉을 잇는 학자가 바로 손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민보는 “손재는 하서·고봉 이후의 일인자라고 말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겠는가?(遜齋之河西高峯後一人 豊墅也哉:같은 글)”라고 말하며, 하서·고봉 이후의 학자로 손재가 제일인자라고까지 말하였다.
손재는 순천 박씨로 문숙(文肅)공 박석명(朴錫命)의 후손으로 광주 출신이다. 아버지 우헌(寓軒) 박상현(朴尙玄)은 큰 학자로 우암 송시열과 학문을 논하고 절친하게 지냈다. 손재는 아버지의 명으로 경상도의 바닷가 장기에서 귀양 살던 우암을 직접 찾아뵙고 제자가 되어 성리학 연구에 생애를 바쳤다. 학문이 높아져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후 대신들의 천거로 내시교관, 시강원자의, 익위사익위 등의 학자에게 내리는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절하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당시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권상하(權尙夏)·정호(鄭澔) 등 우암 문하의 혁혁한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했다. 성리학으로는 높은 수준의 ‘근사록차기’(近思錄箚記)·‘진호문답’(晉湖問答)등 고차원의 학술 이론을 전개한 저술이 있으며 이 모두를 종합한 ‘손재집(遜齋集)’12권 6책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손재는 우암의 제자로 우암의 학문과 성리학을 이어 전통 유학에 밝았으나, 당시 당쟁으로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렸다.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은거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학술적인 저술에 생애를 바친 것이다. 근래에 손재에 대한 학자로서의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분의 높은 학문과 올곧은 삶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미할 뿐이다. 매우 훌륭하게 간행된 문집이 있고 또 고전번역원 문집총간으로도 간행되어 학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넉넉하다. 이제라도 17~18세기 호남의 대표적 학자의 한 분인 손재에 대한 연구와 현양 사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재는 아버지도 높은 수준의 학자였고 아우 박광원(朴光元)도, 아들 박중거(朴重擧) 등도 이름 높은 학자였다. 그러니 순천 박씨의 대표적인 학문가(學問家)로 손색이 없는 집안이었다. 광주 출신 학자로서 고봉 다음의 학자임은 그런 데서도 익히 알아볼 수 있다.
당대의 학자 풍서(豊墅) 이민보(李敏輔:1720~1799)는 “호남학은 하서·고봉을 지나 백여 년 만에 손재 박공이 나왔다.(湖南之學 由河西高峯百有餘年 而故徵士遜齋朴公作焉)”(遜齋集跋)라고 말했고,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1776-1852) 또한 “호남학은 하서·고봉을 경유해 손재·목산(李基敬)에 이르고 또 위백규(魏伯珪) 공이 두 분을 이어 나왔다.(湖南之學 由河西高峯 而至于遜齋木山 公又殿兩賢而作 ··· ‘魏伯珪墓誌銘’)”라고 말하여 하서와 고봉을 잇는 학자가 바로 손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민보는 “손재는 하서·고봉 이후의 일인자라고 말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겠는가?(遜齋之河西高峯後一人 豊墅也哉:같은 글)”라고 말하며, 하서·고봉 이후의 학자로 손재가 제일인자라고까지 말하였다.
손재는 순천 박씨로 문숙(文肅)공 박석명(朴錫命)의 후손으로 광주 출신이다. 아버지 우헌(寓軒) 박상현(朴尙玄)은 큰 학자로 우암 송시열과 학문을 논하고 절친하게 지냈다. 손재는 아버지의 명으로 경상도의 바닷가 장기에서 귀양 살던 우암을 직접 찾아뵙고 제자가 되어 성리학 연구에 생애를 바쳤다. 학문이 높아져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후 대신들의 천거로 내시교관, 시강원자의, 익위사익위 등의 학자에게 내리는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절하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당시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권상하(權尙夏)·정호(鄭澔) 등 우암 문하의 혁혁한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했다. 성리학으로는 높은 수준의 ‘근사록차기’(近思錄箚記)·‘진호문답’(晉湖問答)등 고차원의 학술 이론을 전개한 저술이 있으며 이 모두를 종합한 ‘손재집(遜齋集)’12권 6책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손재는 우암의 제자로 우암의 학문과 성리학을 이어 전통 유학에 밝았으나, 당시 당쟁으로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렸다.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은거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학술적인 저술에 생애를 바친 것이다. 근래에 손재에 대한 학자로서의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분의 높은 학문과 올곧은 삶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미할 뿐이다. 매우 훌륭하게 간행된 문집이 있고 또 고전번역원 문집총간으로도 간행되어 학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넉넉하다. 이제라도 17~18세기 호남의 대표적 학자의 한 분인 손재에 대한 연구와 현양 사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재는 아버지도 높은 수준의 학자였고 아우 박광원(朴光元)도, 아들 박중거(朴重擧) 등도 이름 높은 학자였다. 그러니 순천 박씨의 대표적인 학문가(學問家)로 손색이 없는 집안이었다. 광주 출신 학자로서 고봉 다음의 학자임은 그런 데서도 익히 알아볼 수 있다.